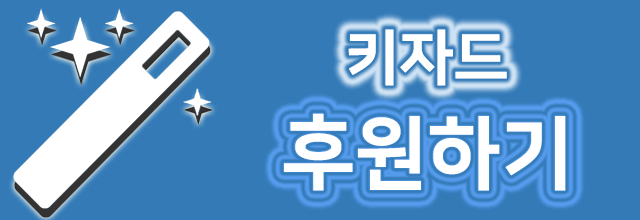scalpel01의 등록된 링크
scalpel0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07건입니다.
Newtonianism, Hales and Buffon [내부링크]
Newtonianism and Hales's Vegetable Staticks 18세기 과학의 개념 중 “힘(forces)”만큼이나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거의 없었다. 뉴턴(Newton)의 <광학(Optics, 1704)>은 빛의 설명은 물론, 저서 끝 부분의 “질문들(Queries)”에 의해 유명해졌고 물리학에서 작용하는 힘의 이해가 화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다가오는 19 세기 전반에 걸친 연구 프로그램이 되었다[u1] . 1740년대까지 대다수 연구자들은 무기체와 유기체의 영역(inorganic and organic realms) 사이에 연속(continuum)을 가정했으며, 따라서 힘(forces)의 언어가 유기체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뉴턴(Isaac Newton, 1642-1727) 및 스티븐 헤일스(Stephen Hales, 1677-1761)의 식물 생리학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mechanical view of plant physio
몽고주름 가설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된 초월형태학의 핵심 : 발생반복관념 (idea of recapitulation) , 발달정체관념(idea of Hemmungsbildudng) [내부링크]
1. idea of great chain of being 2. idea of preformation(evolution) vs idea of epigenesis 3. idea of recapitulation 4.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1787> 5.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Transzendental-morphologie 6. Metaphysical foundation of Idea of Hemmungsbildung : Schelling’s Naturphilosophie 7. Hemmungsbildudng Lehre, Meckel 8. Epicanthischen Lehre in the context of Hemmungsbildung Lehre idea of great chain of being(scala naturae) 아리스토텔레스(Ar
현재 의학사전의 epicanthus(몽고주름) 의미 <Current meaning of Epicanthus in dictionary> [내부링크]
Current meaning of Epicanthus in dictionary: variously distorted from Ammon’s original definition 동양인 눈꺼풀에서 우리말 ‘몽고주름’[bk3] 이라 불리는 것의 원래 의학적 명칭 및 개념은 역사적으로 독일 안과의사인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bk4] 에 의해 1831년 ‘Epicanthus, epicanthische Falte(독일어)[bk5] ’로 명명되고 병리학적 구조물로 이론화되었다. 그림.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Bildungsfehler)> 하지만 이러한 epicanthus hypothesi
Influncers to Ammon [내부링크]
Influncers to Ammon 아몬은 1799년 9월 10일 독일 괴팅겐(Göttingen)에서 가족의 다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가족들은 아몬이 젊음을 보내게 되는 에를랑겐(Erlangen)으로 이사했다. 그의 출생 직후 아몬 가문은 괴팅겐에서 에르랑겐으로 이주하였는데, 거기서 성장기를 보냈다. 1813년 그의 아버지가 드레스덴(Dresden) 작센 왕실의 부름으로 작센 법원에서 일하기 위해 다시 이사했을때 프리드리히는 함께 왔으며, 이듬해에 슐프포르다(Schulpforta)의 왕립 학교에 입학했다. 1818 년 Ammon은 라이프치히 대학 (University of Leipzig)에 의학공부를 위해 입학했고 약 6 개월 후 라이프치히 (Leipzig)를 떠나 Göttingen의 Georgia Augusta University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아몬의 지도교수는 칼 힘리(Karl Himly,1772~1837)와 콘라드 요한 마틴 랑엔벡(Konra
Albrecht von Haller (할러) [내부링크]
독일 괴팅겐 대학교(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의과대학 교수였던 Haller(Albrecht von Haller, 1708~1777)의 생리학(physiology)은 기본적으로 뉴턴(Isaac Newton, 1642-1727) 자연 철학(natural philosophy)에 대한 경외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1687년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æ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를 출간하였는데, 18세기의 맥락에서 뉴턴의 과학이론이나 과학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 뉴턴의 과학을 뉴턴의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으로 지칭하고, 뉴턴의 실험적 방법을 강조할 때는 ‘프린키피아(Principia)’ 제 2판의 편집자인 코츠(Roger cotes, 1682-1716)의 용법에 따라서 뉴턴의 ‘실험철학(experimental philosophy)’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과학(sc
몽고주름 이란? 몽고주름 제거와 쌍꺼풀주름의 관계는? 윗트임 / 앞트임 수술, 재수술 해부학적 원리를 이해하려면 몽고주름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몽고주름’이라는 우리말 용어는 19세기 초 당시 독일의학에서 epicanthus라는 발달정체 기형(Bildungsfehler, Fehler der Urbildung, Meckel(Johann Friedrich Meckel, 1781~1833)이 조어한 19세기 독일 기형학 용어)이 mongolen Rasse(몽골 인종, 즉 동양인 인종)에 높은 빈도로 존재한다고 간주된 측면으로 인해 독일어 Mongolenfalte, 영어 mongolian fold라고 불리기도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림.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Bildungsfehler)> 하지만 이러한 epicanthus hypothesis(몽고주름 가설)은 명백히 잘못된 기형학
Carl gustav carus(카루스), transcendental morphologist(초월형태학자) [내부링크]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1869)는 epicanthus hypothesis 논의에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카루스는 드레스덴에서 아몬과 친밀한 관계였던 의사이자 자연철학 사상가이며, 아몬의 epicanthus 논문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Bildungsfehler)>에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는 학자이다............ 카루스와 아몬의 관계 어떠한 현상은 그 시대의 과학이론에 의해서 그 시대의 과학지식과 용어로 설명된다.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 1922-1996)에 의하면 동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
몽고주름 제거 피판술: 우찌다 방법, park method(Z epicanthoplasy) [내부링크]
19세기 초 안과 및 성형외과학 태동기의 선구자인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은 현재의 동양인 눈꺼풀 해부학 및 쌍꺼풀수술에 형성되어있는 잘못된 고정관념(stereotype)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아몬은 epicanthus 및 epiblepharon이라는 특별한 해부병리학적 명칭과 개념을 도입하여 동양인 눈꺼풀을 두가지 피부기형으로 간주하였고, 이분법적 관점(dichomatous view point)을 초래하였다. 아몬의 1860년 논문 제목은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Bildungsfehler)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이고, Bildungsfehler는 기형을 의미하는 19세기 독일 의학용어이다. 아몬의 1860년 논문 이후,
Gifford, H: The Mongolian Eye, Am. J. Opth. 11:887, 1928 [내부링크]
어떤 저자들은 Mongolian fold와 Epicanthus 가 같은 것이라고 하고, Fuchs등은 epicanthus가 몽고인종의 normal characteristics 이라고 하지만 이는 호도되기 쉽다. 잘 발달된 epicanthus는 다른 인종보다 Mongolian에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지 않았고, Motais가 잘 지적했듯이 Mongolian에서 흔히 보이는 fold는 band(passes obliquely from the skin of the upper lid to the side of the nasal bridge without curving downward and again outward as in epicanthus)이다. Motais는 이를 bride라 불렀다. 64명의 캘리포니아 중국성인에서 57%에서 fold(in the sense of Motais)가 있었고, 3-10세 사이의 중국인, 일본인 아동 30명 중 50 %에서 fold를 관찰 할 수 있었고 3명
목차 [내부링크]
An epistemologic research about anatomical concept of Asian eyelid (전체 논문 제목) 목차 1. Introduction 2. The paradigmatic approach : Naturgeschichte, transzendentale Morphologie, Biologie 2-1.Thomas kuhn's paradigm concept and epicanthus hypothesis 1. paradigmatic approach to idea of epicanthus 2. epicanthus theory(transcendental morphology) vs epicycle theory (Geocentric theory) 2-2. idea of Epicanthus in the context of Rasse, Ethnologie 1. Kant's theory of race 2. semantic field of 'race', 'ethnic'
칸트(Kant)의 후성설(epigenesis) 사상 [내부링크]
지난 수십년 동안 후성설(epigenesis) 과학 이론의 의미와 칸트(Imanuel Kant, 1724-1804)의 비판 철학(Kant's critical philosophy)에 대한 이 이론의 중요성은 점점 더 핵심적 문제가 되어왔다. 후성설(Epigenesis)은 특히 2013년 멘쉬(Jennifer Mensch)의 <Kant's Organicism>의 출간과 함께 최근 Kant 연구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Mensch의 연구는 18 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기적 발생(organic generation)의 후성론적 모델이 어떻게 “칸트의 인지 이론(Kant’s theory of cogni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를 “정신의 후성론적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다. Mensch의 참신한 관점과 독해는 초월적 관념론(transcendental idealism)의 중심에 놓여있는 핵심 문제와 궁극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 괴팅겐학파의 태두 [내부링크]
Blumenbach 체질인류학의 창시자로 언급되는 괴팅겐대학교(독일어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의대 교수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는 1775년 논문에서 인종 분류 연구의 선행자로 린네(Carl Linné, Carl Linnaeus, 1707~1778) 를 언급하고, 실제로 린네의 인간 변종(varietas) 분류를 따라서 인종집단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블루멘바흐는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처럼 단일기원설(monogenism)을 지지하며 기후의 영향에 따른 퇴화이론(theory of degeneration)을 전개했다. 영장류 비교해부학(comparative anatomy of apes)에서 시작하여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과 ‘과학적’ 인종주의 관념(conception of a scien
Gattung(속 혹은 종, genus or species) 및 Rasse (race, 종족) : 칸트의 사상 [내부링크]
18세기 독일어 Gattung(속 혹은 종, genus or species) 및 Race(race, 종족)에 대한 관념의 근간을 이루는 유기체 및 생명 발생(generation)에 대한 칸트의 자연사(natural history)에 대한 사상에 대하여서 살펴보자. 자연사(Naturgeschichte, natural history)에 대한 “칸트의 원칙"은 실제로 괴팅겐학파 생리학자 Blumenbach(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의 원칙과의 공통점, 즉 Buffon(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의 퇴화에 대한 아이디어(Buffon’s idea of degeneration)를 채택하였다는 중요한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해, Kant로부터 물려받은 듯 보이는 Blumenbach의 사고 틀(framework)은 실제로는 상당 부분 Buffon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Kan
칸트의 인종이론 (Kant's theory of race) [내부링크]
생명과학 역사에서 18세기 이후 인간종족 관념(idea of human race)은 인류의 자기 개념(idea of self) 및 타인에 대한 관점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발상이다. 독일어 ‘Rasse(종족, race)’라는 용어는 18세기, 19세기 및 20세기에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화, 종교, 국가, 언어, 민족 및 지리에 기반한 인간 집단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인종(Rasse)이 자연과학계에서 처음으로 체계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18세기 중후반의 일이지만 그 이래로 인종 개념은 과학계에서 그 핵심적 입지를 갈수록 굳혀 가게 되었다.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과학계에서는 인종(Rasse, race)에 대한 고도로 복잡한 사상 체계가 발달하였으나 이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최소한 은연중에 인종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과학의 언어, 개념, 방법 및 권위를 끌어들여 지성(intelligence)이나 문명화된 행동(
독일 자연철학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철학적 해석 사조, 신수정주의(new revisionism) [내부링크]
Epicanthus hypothesis에 관한 상세한 논의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18-19세기 당시의 독일의학 뿐만아니라 Epicanthus의 배경이론이 된 idea of recapitulation(발생반복관념), Hemmungsbildung Lehre(발달정체학설) 도출의 바탕이 된 괴팅겐학파의 생기론적 생리학(vitalistic physiology), 독일 관념론(특히, 자연철학(Naturphilosophie))과 초월형태학(transcendental morphology)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자연철학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철학적 해석 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학자들은 특히 종교 및 철학적 측면에서 독특한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였다. 생물학사가들(historians of biology)은 18세기 전반에 걸쳐 독일 생명과학(German life science)의 발전상을 마땅찮게 여기며 이들이 자연철학(Naturphilosophie)
1. Introduction(An epistemologic research about Anatomical concept of Asian eyelid) [내부링크]
1. Introduction 이차대전 이후 현대의학에서 지금까지 동양인(Asian)과 서양인(Caucasian) 눈꺼풀의 해부학적 차이(anatomical difference of eyelid)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동양인 쌍꺼풀수술(Asian double eyelid surgery)에 관한 대부분의 책과 논문 서두에 언급되듯이 가장 특징적인 육안해부학적 차이(gross anatomical difference)는 쌍꺼풀주름의 부재(lack of palpebral fold)와 몽고주름의 존재(presence of epicanthus) 로 언급되어져 왔고 동양인 눈꺼풀 해부학의 두가지 기본 전제(basic premise)로서 마치 당연한 공리(axiom)처럼 여겨지고 있다. [bk1] 그림. Asian eyelids의 다양한 형태들 (various types of Asian eyelids) Epicanthus 혹은 epicanthal fold라는 용어는 현재 ‘a vertical
2-1. The paradigmatic approach : Kuhn의 패러다임 개념(paradigm concept)과 epicanthus hypothesis (몽고주름 가설) [내부링크]
2. The paradigmatic approach : Naturgeschichte, transzendentale Morphologie, Biologie 2-1.Thomas kuhn의 패러다임 개념(paradigm concept)과 epicanthus hypothesis 1. paradigmatic approach to idea of epicanthus 2. epicanthus theory(transcendental morpholoy) vs epicycle theory (Geocentric theory) paradigmatic approach to idea of epicanthus 동양인 눈꺼풀(Asian eyelid)에 대한 현재의 해부학적 개념(current anatomical concept)을 인식론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의 epicanthus hypothe
2-2. The paradigmatic approach : idea of Epicanthus in the context of Rasse, Ethnologie [내부링크]
2. The paradigmatic approach : Naturgeschichte, transzendentale Morphologie, Biologie 2-2. idea of Epicanthus in the context of Rasse, Ethnologie 1. Kant's theory of race 2. semantic field of 'race', 'ethnic' : historical change 3. fallacy of false dilemma(잘못된 딜레마의 오류) Kant's theory of race 몽고주름관념(idea of epicanthus)에 대한 패러다임적 접근법의 시작점으로서 인종관념(idea of race)과 관련된 'Rasse, ethnographie, ethnologie, ethnologische' 독일어 단어들의 역사적/언어학적 의미역(semantic field) 분석을 위해서는 18세기 말 독일 학자들의 인종관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칸트(Iman
2-3. The paradigmatic approach : transzendentale Morphologie as paradigm of German life science [내부링크]
2. The paradigmatic approach : Naturgeschichte, transzendentale Morphologie, Biologie 2-3. paradigm shift in the field of life science 1. transzendentale Morphologie : paradigm of German life science in early 19th century and metaphysical foundation of epicanthischen Lehre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19세기 초중반 독일생명과학의 패러다임 및epicanthischen Lehre(몽고주름 학설)의 형이상학적 토대(metaphysical foundation)) 2. paradigm shift to evoutionary biology for anatomy of Asian eyelid transzendentale Morphologie : pa
3-1. Naturgeschichte and Metaphysics in late 18th ~ early 19th century (18세기 자연사 및 형이상학) [내부링크]
3. Historical perspectives of life science for anatomical concept of Asian eyelid 3-1. Naturgeschichte and Metaphysics in late 18th ~early 19th century 1. A shift in perception in the domain of the Naturgeschichte in late 18th ~early 19th century 2. French vital materialism: Buffon, Maupertuis, Diderot a. Newtonianism in 18th century and concept of foce b. Newtonianism and Hales's Vegetable Staticks c. Buffon, the French Newtonian d. Maupertuis, Buffon, and the Problem of Form e. Histoire natura
3-2.Transcendental morphology : idea of recapitulation, idea of Hemmungsbildudng [내부링크]
3. Historical perspectives of life science for anatomical concept of Asian eyelid 3-2.Transcendental morphology : 1. idea of great chain of being 2. idea of preformation(evolution) vs idea of epigenesis 3. idea of recapitulation 4.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1787> 5.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Transzendental-morphologie 6. Metaphysical foundation of Idea of Hemmungsbildung : Schelling’s Naturphilosophie 7. Hemmungsbildudng Lehre, Meckel 8. E
3-3.Transcendental morphology:Carl gustav carus, Influncer to Ammon as a transcendental morphologist [내부링크]
3. Historical perspectives of life science for anatomical concept of Asian eyelid 3-3.Transcendental morphology : Carl gustav carus, a Influncer to Ammon as a potent transcendental morphologist 어떠한 현상은 그 시대의 과학이론에 의해서 그 시대의 과학지식과 용어로 설명된다.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 1922-1996)에 의하면 동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한다. 역사적 인물과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에게 가장 중요한 영
6-1.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내부링크]
6-1.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1. Human Embryology and Morphology(1913) by Arthur Keith 2. Arthur Keith, 1866-1955 3. Louis Bolk, 1866-1930 Human Embryology and Morphology(1913) by Arthur Keith 1905년 동양인과 서양인의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의 해부학적 차이 즉, 동양인에서 levator aponeurosis를 포함한 눈꺼풀 구성요소의 해부학적 특성을 연구한 일본인 해부학자 Adach의 독일어 논문이 발표되었고, epicanthus hypothesis도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되어 이미 규명되고 정리되었을 수도 있었다. 20세기 초 초월해부학의 발달정체(arrested development, Hemmung
6-2.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내부링크]
6-2.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4. Goethe’s Morphology 5. Ernst Haeckel(1834-1919) : evolutionary recapitulation theory 6.Ernst Haeckel and Carl Gegenbaur, Gegenbaur school of comparative anatomy Goethe’s Morphology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독일 최고의 문호이지만 인류 지성사에서 사상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인물이다. 그의 세계관은 계몽시대의 기계론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스피노자(spinoza)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기조로 하는 범신론(panentheism, 汎神論)적 발전관이며, 생명과학(life science) 역사에서 19세기말 초기
6-3.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내부링크]
6-3.Succession of idea of epicanthus :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7. 형태학 계보 맥락의 두개골 척추 이론(The Vertebral Theory of the Skull in the Context of Genealogy of Morphology) 8. Fetalization theory(A modified idea of Hemmungsbildung) 9. Scottish Antomists in the context of Epicanthus in 19th century 형태학 계보 맥락의 두개골 척추 이론(The Vertebral Theory of the Skull in the Context of Genealogy of Morphology)[bk1] 볼크(Louis Bolk, 1866-1930)의 fetalization theory(태아화이론)에 내재된 인간화(anthropogene
7-1. Misperception of the epicanthus as a transitional structure in fetal period [내부링크]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 은 모든 인종(all races)의 태아기 초기에 epicanthus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논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이후의 저자들이 태아기 발달과정에서 epicanthus가 정상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 및 명제의 근거 혹은 시발점이 된 Ammon의 original description과 이와 관련된 발달정체학설(Hemmungsbildung Lehre) 및 발생반복관념(idea of recapitulation)에 대한 내용을 그의 1860년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는 Epicanthus congenitus가 얼굴전체 중 특정 부위에서 단순하게 발달이 정체되는 기형(Hemmungsbildung)인지에 대해서, 즉 epicanthus형태를 띠는 피부부위(dermatischen theile im metopon epicantisch gebildet)가 태아의 특정 시기에
7-2. Misperception of the epicanthus as a transitional structure in fetal period-관찰의 이론적재성 [내부링크]
Ammon's misperception: theory-laden observation (관찰의 이론적재성) 자연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과학자가 새로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발견한 후 학문적 진리를 찾으려고 연구하는 과정에 특정한 것이 존재한다고 인식, 명명하고 이를 설명하기위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속의 인식이나 사실들은 실제로는 옳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학자의 길은 자연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실제세계와 인식세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관념이나 이론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기존의 사고체계가 틀릴 수 있음도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다. 과학자에게는 논리적 사고 뿐만아니라 보다 깊은 인식론적 통찰력도 필요하다. 손턴(Robert Thornton)과 아인슈타인이 주고받았던 편지는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 손턴이 대학교수로 물리학 수업을 맡은 후 아인슈타인에게 물리학 수
8. Denial of Epicanthus hypothesis(as a congenital anomaly) 몽고주름 가설의 부인 [내부링크]
8. Denial of Epicanthus as a congenital anomaly & Not a manifestation of Mongolism (Trisomy 21) 1. Epicanthus(몽고주름)에 대한 해부병리학적/조직학적 관찰의 역사 2. idea of Epicanthus : Not a congenital anomaly, mere superflous concept 3. Epicanthus : Not a manifestation of Mongolism (Trisomy 21) 4. Denial of Epicanthus hypothesis(Epicanthischen Lehre, von Ammon) Epicanthus(몽고주름)에 대한 해부병리학적/조직학적 관찰의 역사 현재 국내에서 의사 및 대중들이 '몽고주름'이라 부르는 부위는 병리학적 기형이 아니라 쌍꺼풀주름의 약화 및 육안해부학적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표재성 부산물로서, 정상적인 환경적응적 연부조직 변이(variatio
9. The classification of the epicanthus : relationship between epicanthus and palpebral fold [내부링크]
The terminology and original classification of the epicanthus : relationship between epicanthus and palpebral fold(epicanthus의 용어 및 분류, 아몬의 원논문 상의 epicanthus와 쌍꺼풀주름의 관계 및 역사적 전승과정상의 왜곡 ) 1. Original classification of the epicanthus and relationship between epicanthus and palpebral fold by Ammon 2. Distortion of Ammon's original classification in the historical succession and translation 3. Clinical classification of Asian eyelid by evolutionary formal alteration of palpebral fold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쌍꺼풀주름의 부재(lack of palpebral fold)와 몽고주름의 존재(presence of epicanthus) [내부링크]
쌍꺼풀주름의 부재(lack of palpebral fold)와 몽고주름의 존재(presence of epicanthus) 검증되지 않은 가설인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의 epicanthus hypothesis 및 Sayoc's doctrine으로 인해 초래된 동양인 눈꺼풀의 해부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론과 고정관념은 현대 성형외과 의사들의 해부학적 관점과 통찰력을 오도(misleading)한 측면이 많다. 최근까지도 동양인 눈꺼풀(Asian eyelid)에 대하여 쌍꺼풀주름 부재(absence of palpebral fold)와 epicanthus의 존재(presence of epicanthus)를 두가지 중요한 해부학적 특성으로, 무비판적으로 반복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Ammon은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의 핵심 해부학적 구조인 skin-levator aponeurosis connection을 형성하는 te
peculiar ethnic characteristics( in Epicanthus article) [내부링크]
peculiar ethnic characteristics 현대 영어 의학 교과서 및 논문들에서 epicanthus를 설명하기위해 종종 사용되고있는 영어 단어 peculiar ethnic characteristics는 19세기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의 독일어 문헌에 사용된 eigenthümlich, ethnologische, Charakter에서 유래한 대응 번역어가 지속적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아몬의 1860년 논문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shaut‚ Ammon 1860>의 제 4장의 제목은 <Ⅳ. Epicanthus는 특정 민족줄기에 나타나는 고유의 종족특질인가? (Kommt dem Epicanthus eine Bedeutung als Raceneigenthümlichkeit gewisser Völker
몽고주름 : 용어의 유래와 의미 [내부링크]
의학용어 Epicanthus 혹은 epicanthal fold(epicanthic fold, mongolian fold)는 국내에서 흔히 독일어 Mongolenfalte의 번역어인 '몽고주름'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Mongolenfalte에서 ‘Mongol(몽골)’은 18세기부터 인류학에서 동양인 인종(Rasse, race)을 의미하던 단어 ‘Mongoloid’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러한 Mongolenfalte(몽고주름)라는 용어에는 인종 혹은 종족으로 번역되는 18세기 자연사 시대에 중요 이슈였던 ‘Rasse(race, 종족, 인종)’이라는 생물분류군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몽고주름’이라는 우리말 용어는 19세기 초 당시 독일의학에서 epicanthus라는 발달정체 기형(Bildungsfehler, Fehler der Urbildung, Meckel(Johann Friedrich Meckel, 1781~1833)이 조어한 19세기 독일 기형학 용어)이 mongolen R
몽고주름 관념(idea of epicanthus)의 바탕이 된 생물학적 인종 관념(idea of biologic racism) [내부링크]
Idea of race(biologic racism) under idea of epicanthus Idea of race : ground idea for epicanthus hypothesis in early 19th century 1. Introduction 2. Human distinction and discrimination of varieties in 17th century 3. Varietas and race in 18th century : Linne vs Buffon 4. Ape debate 5. Kant 6. Blumenbach Johann Friedrich Blumenbach The Dissertation of 1775 on Human Variety The Handbuch der Naturgeschichte (1779–1782) 7. Traditional hierarchy and idea of gradation 8. Transcendental morphology as
epicanthischen Lehre(몽고주름학설) vs epicanthus hypothesis(몽고주름가설) [내부링크]
아몬은 1860년 논문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에서 자신의 주장을 epicanthischen Lehre(Epicanthus 학설)이라 기술했었다. 이 논문은 파리 지헬(Dr. J. Sichel) 박사에게 보내는 헌정글(Sendschreiben an Herrn Dr. J. Sichel in Paris.)로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술되어있다. 존경하는 동료, 지헬(Sichel) 박사님! 1831년에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 안면피부의 발달오류(Bildungsfehler)에 대한 글을 작성했고, 직접 Epicanthus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를 묘사한 그림과 함께 안전한 치료방법인 Rhinoraphe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논문이 알려지기 시작하자마자 독일 내에서 Epicanthus와 그 치료법에 대
Sichel (Frédéric Jules Sichel, 1802-1868) 지헬 [내부링크]
Sichel(Frédéric Jules Sichel, 1802-1868) Sichel(Frédéric Jules Sichel, 1802-1868)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프랑스인 안과의사였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태어났고 Würzburg, Tübingen, Berlin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832년에 파리에 최초의 안과클리닉을 개설한 의사로서 프랑스의 초기 안과 성립에 기여하였고 저명한 안과의사인 Desmarres 등이 그의 제자이다. 노먼(Norman)은 Morton 's Medical Bibliography 5 판에서 1838년 출간된 Ammon의 Klinische Darstellungen der Krankheiten und Bildungsfehler des menschlichen Auges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했다. '이 위대한 컬러 플레이트 아틀라스는 검안경이 도입되기 이전에 눈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아마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몽고주름 학설(epicanthischen Lehre)을 제안한 Friedrich August von Ammon, 성형외과 선구자로서의 업적과 시대적 한계 [내부링크]
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은 19세기 초의 저명한 독일 안과 의사이자 성형외과의사이다. 신학자 Christopher Friederich von Ammon 교수의 아들로 괴팅겐(Göttingen)에서 태어났다. Ammon은 안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헌을 남겼지만, 성형 외과 분야의 선구자 중 한명이기도 하다. 안과학은 19세기 전반 유럽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는데, 특히 드레스덴은 아몬(1799-1861)으로 인해 안과학이 임상적이고 과학적이며 독립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도시이다. 아몬은 전반적인 외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과학에 대하여 그의 문헌적 기여를 대부분 했지만, 당시 또다른 떠오르던 의학 분야인 성형외과학에도 크게 기여했다. 아몬은 당시 드레스덴(Dresden)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이자 작센(Sachen) 왕가의 개인 주치의로서도 활동했다. 선천성 눈 기형 및 안과 성형수술에 대한 아몬의 특별한 관심은
Ammon 의학적 몽고주름 가설에서는 Mongolischen Rasse(몽골 인종, 동양인)의 Epicanthus가 발생학적 발달정체(Hemmungsbildung)라고 정의되었다. [내부링크]
1831년 Epicanthus hypothesis(몽고주름가설)를 처음 제안한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이 학술활동을 하던 19세기 전반기는 독일뿐만아니라 유럽에서 사상적으로 자연철학(Naturphilosophie) 및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이 생명과학 사상을 지배하던 시기이다. 우리는 Epicanthus 연구와 관련하여 독일 관념론(Deutcher Idealismus, German idealism)에 기반한 초월형태학(transcendental morphology)이 지배하던 19세기 전반의 시기가 바로 Ammon이 학술활동을 하던 바로 그 시기임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초월형태학의 핵심적 관념은 idea of recapitulation 및 idea of Hemmungsbildung(arrested development)이며 Bildungsfe
초월적, 초월철학, 초월형태학 :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 몽고주름 가설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된 초월형태학 [내부링크]
1.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1787> 2.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Transzendental-morphologie 3.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초월해부학(transcendental anatomy) : epicanthischen Lehre(몽고주름 학설)의 형이상학적 토대(metaphysical foundation) The meaning of ‚transzendental‘ in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1787> transzendental Morphologie (초월형태학), transzendental Anatomie(초월해부학)의 transzendental(초월적)은 칸트철학을 의미하는 용어 Transze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초월해부학(transcendental anatomy) [내부링크]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초월해부학(transcendental anatomy) : epicanthischen Lehre(몽고주름 학설)의 형이상학적 토대 Epicanthus hypothesis의 사상적 기반이 된 발생반복관념(idea of recapitulation) 및 발달정체관념(idea of arrested development)은 19세기 초 독일 자연철학(Naturphilosiphie) 및 유럽 초월해부학(transcendental anatomy)의 핵심적 개념들이다. 우리는 18세기 말에서 아몬이 활동하던 19세기 중반까지 초월해부학 등 초기 생물학 사상 및 인간 과학(human sciences)의 태동과 발전이 본격적인 인종 논쟁(race debate)에서 결정적 요소였던 점을 기억하고 race(인종) 및 Epicanthus(몽고주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19세
독일 자연철학(Deutsche Naturphilosophie) 및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형이상학적 토대 [내부링크]
우리는 18세기 말엽에서 아몬이 활동하던 19세기 중반까지 초월형태학 등 초기 생물학 사상 및 인간 과학(human sciences)의 태동과 발전이 본격적인 인종 논쟁(race debate) 및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성립에 있어 결정적 요소였던 점을 기억하고 race(인종) 및 epicanthus(몽고주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1831년 Epicanthus hypothesis(몽고주름가설)를 처음 제안한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이 학술활동을 하던 19세기 전반기는 독일에서 사상적으로 자연철학(Naturphilosophie) 및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이 지배하던 시기이다. 19세기 초반 예나(Jena),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뮌헨(Munich), 에를랑겐(Erlangen), 기센(Gießen), 라이프치히(Leipz
19세기초 서양학자들이 보기에는 동양인의 눈꺼풀이 ‘비정상’으로 보였다. : 몽고주름이라는 기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내부링크]
서양인, 흑인들의 눈을 보면 쌍꺼풀주름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동양인과 달리 눈머리를 가리는 주름구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19세기초 서양학자의 눈에 동양인의 눈꺼풀이 생소하고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Epicanthus hypothesis(몽고주름 가설)이 처음 주장된 19세기 초 당시는 기형학, 안과학, 성형외과학이 학문적으로 성립되고 있던 시기였다. 아몬은 1860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picanthus의 형성(Epicanthusbildung)은 내안각 형태(Form des inneren Augenwinkels)와 안검열 조형(Gestaltung der Augenspalte)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두가지는 바로 앞서 언급한 Epicanthus로 인한 인상(Eindruck)을 결정짓게 된다. 사람얼굴 인상(Physiognomie des Menschen)에서 내안각의 형태와 그 위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눈이란, 정상적으로 생긴
Plastic Surgery, Neligan 2013 [내부링크]
Plastic Surgery, Neligan 2013 Asians are described by westners as having puffy, small eyes, epicanthal folds, and lack of supratarsal folds. About 50% of women in East Asia have these features. Asian blepharoplasty or “double eyelid” surgery is the most common cosmetic operation in Asia. The first procedure to create a supratarsal fold or “ double eyelid” was described by Mikamo in 1896. In the western countries, Sayoc reported anatomic differences of upper eyelids between Caucasians and East As
고식적 피부판 앞트임수술 방법들(methods of conventional skin flap epicanthoplasty) vs 진화생물학적 윗트임 [내부링크]
19세기 초 안과 및 성형외과학 태동기의 선구자인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은 현재의 동양인 눈꺼풀 해부학 및 쌍꺼풀수술에 형성되어있는 잘못된 고정관념(stereotype)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아몬은 19세기 초 epicanthus 및 epiblepharon이라는 특별한 해부병리학적 명칭과 개념을 도입하여 동양인 눈꺼풀을 두가지 피부기형으로 간주하였고, 이후로 동양인 눈꺼풀 해부학 및 수술에 잘못된 이분법적 관점(dichomatous view point)을 초래하였다. 그림.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1860) 논문 속 삽화. Epicanthus caruncularis 징후(Darstellung), 단순한 선 모양의 피부 색소침착(strichartigen Hautfärbung)의 형태인
사욕의 교리(Sayoc’s doctrine of levator expansion) [내부링크]
세계2차대전으로 인해 학문적 연구 및 교류가 상당기간 중단되었고, 인적 물적 상실로 인해 전쟁은 많은 것을 역사적으로 단절시키고 변화시켰다. 이차대전 후 패전국 독일 및 일본 의학은 전쟁 후의 시대적/정치 이데올로기적 상황으로인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즉, 종전 후 승전국 중심의 영어권 세계질서 속에서 수십년간 독일과 일본의 학문적 성과들은 영어권 학계에서 묵시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잊혀져 있었던 것이다. 대신에 이 시기에 영어권 의학에서 동양인 쌍꺼풀주름(Asian Palpebral fold)에 대한 현재의 해부학적 통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학자로 과대평가된 인물은 1956년 논문에서 “동양인의 홑꺼풀에는 terminal radiating fibers of levator aponeurosi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임상적으로 주장한 이차대전 미군 군의관 출신의 필리핀 의사Sayoc(Burgos Topacio Sayoc, 1904 - 1976) 이었다. 1
동양인의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은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생애주기 동안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말단방사섬유 흔적기관 [내부링크]
동양인의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은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생애주기 동안 발현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각 개인의 눈꺼풀에서 하루 중에도 신체 컨디션에 따라 홑꺼풀과 쌍꺼풀 상태가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동양인에서는 각 개인의 눈꺼풀에서도 눈의 피로, 일주기 변화속 눈꺼풀 붓기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홑꺼풀과 쌍꺼풀이 상태에 따라 변화하며 나타나는 것이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부학적 구조의 잠재성(latency) 즉, 흔적기관(vestigial organ)으로 간주되어야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생물학의 근간인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침팬지 등의 영장류에도 있는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이 유독 동양인에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양인 눈꺼풀 해부학적 개념의 기본 전제(basic premise)를 이루고 있는 두가지 고정관념(sterotype)들
vestigia의 인식론적 유래 : idea of Hemmungsbildung Reste(독)=vestigia(영)=흔적기관(한) [내부링크]
현대 진화생물학이 발전되면서 초월형태학(transcendental morphology)의 발생반복관념(idea of recapitulation)및 발달정체관념(idea of Hemmungsbildung)은 이차대전 이후 점차 학술적으로 부인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지만, 메켈의 발달정체관념은 인식론적으로 현대 생물학의 ‚vestigia‘ 즉 ‚흔적기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Author Year Terminology Idea Harvey 1651 none Epigenesis and metamorphosis Idea of ‘arrest’ in the case of cleftlip/palate Kielmeyer 1793 Über die Verhältnisse der organischen Kräfte untereinander in der Reihe der verschiedenen Organisationen, die Gesetze und Folgen diese
Blepharoplastik (독일어) = blepharoplasty (영어) = 눈꺼풀성형술 (우리말), Gräfe(그래페), Ammon(아몬) [내부링크]
Blepharoplastik(blepharoplasty), Gräfe, Ammon 현재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을 형성하는 "쌍꺼풀수술(double eyelid surgery)"로 불리는 동양인의 눈꺼풀성형술(Asian blepharoplasty)은 동아시계 여성들에게 가장 흔히 시행되는 미용수술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눈꺼풀성형술(Asian blepharoplasty)은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이 육안해부학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홑꺼풀'이나 작은 쌍꺼풀주름을 가진 눈꺼풀에서 연부 조직 구조를 변화시켜 원하는 형태의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를 새롭게형성하는 미용성형수술, 즉, 쌍꺼풀수술(double eyelid surgery)을 의미한다. 성형외과 임상적으로 동양인의 눈꺼풀을 육안해부학적으로 설명할 때 '홑꺼풀(single eyelid)', '쌍꺼풀(double eyelid)', '쌍꺼풀주름(palpebral fold)', '몽고주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생명과학, 하비의 발생학(epigenesis) [내부링크]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생물학 업적에 대한 지식 없이는 생물학과 해부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후대의 해부학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동물학은 2,000년 이상 인류의 중요한 학문적 양식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에서 중세에 걸친 최고의 생물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식민지인 스타게이라에서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다. 당시 관습에 의해 그 자손들은 의학 및 해부에 관한 기술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물학과 과학 일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살이 되던 해 아테네에 있는 플라톤 아카데미아에 입학한다. 사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저작물들은 동물학 문헌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이룬다. 그는 동물의 여러 종은 각각 특수한 영혼(Ψυχῆς(Psyches), anima)을 가지고 있고,
목적론 vs 기계론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데카르트(Descartes), 슈탈(Stahl) [내부링크]
르네상스로 과학혁명이 시작되고 실증적인 물리학, 화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관도 변화하였는데 목적론(teleology)을 대체한 기계론(mechanism)이 바로 그것이다. 기계론적인 철학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에서도 나타나지만, 17세기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에 의해 명료하게 정립되었다. 생물은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며,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기계론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물질에는 무기물, 식물, 동물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는 공통의 역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였고, 18세기에는 인간의 몸도 기계라고 간주하였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은 생명현상들 속에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점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에서 두드러지는 합목적주의, 즉 기관을 설명하는 것은 기능이고, 생명체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기능들의 합목적적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근대 생명과학(life science)의 길은 자연(nature)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법 혁명의 첫 걸음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링크]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 로부터 시작되어, 로크(John Locke, 1632-1704)에서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으로 이르는 근대 생명과학의 길은 자연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법 혁명의 첫 걸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접근은 자연의 부분 간 구분의 탐구와 동시에 단일성(unity)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발생(generation), 분류(classification), 자연사(natural history)에 대한 질문들이 18세기 중엽까지 생명 과학 탐구를 규정짓고 있었으며, 이들이 18세기 중반 철학자 칸트(Kant, 1724-1804)의 자연사에 대한 관심의 배경을 이루었으므로, 이 질문들의 역사도 살펴보아야 한다. 자연의 발생과 분류 관련 질문(questions concerning the generation and classification of nature)에
스바메르담(Swammerdam, 1637~1680)의 전성설 [내부링크]
스바메르담(Swammerdam, 1637~1680) 은 사후 출간된 자신의 저서 <곤충의 자연사>(Historia insectorum generalis, 1685)에서 곤충의 유충(insect grub)이 수컷 정액(semen)의 자극을 받은 암컷 정액에 의하여 생겨나고, 초기 애벌레(larva)에 이미 성체 형태가 담겨 있으며 외부 표피가 벗겨지고 이미 존재하는 체내 부위가 보강 및 확대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Jan Swammerdam, Historia insectorum generalis, translated from the Dutch by H. Henninius (Holland: Luchtmans, 1685), pp. 44-45.) 그는 이 전성설 이론(theory of preformation)을 영국학자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가 주장한 변태(metamorphosis) 및 후성설(epigenesis) 개념의 대항마로 내세웠다. 하비
쉬탈(Georg Ernst Stahl)의 유기체 개념(concept of organism) [내부링크]
독일 할레(Halle)대학교 의과대학은 창립 순간부터 당대 유럽 의학계 최고의 거장 2명, 즉 프리드리히 호프만(Friedrich Hoffmann)과 게오르크 에른스트 슈탈(Georg Ernst Stahl)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다. 창립 교수진이었던 프리드리히 호프만(Friedrich Hoffmann, 1660~1742) 및 게오르크 에른스트 슈탈(Georg Ernst Stahl, 1659~1734)은 1694년 대학 창립 때부터 1715년 슈탈이 베를린으로 옮길 때까지 할레(Halle)대학교 의과대학에 같이 재직했다. 라이덴대학교를 유럽 전역에서 의학 교육 분야의 성지로 만든 헤르만 부르하버(Herman Boerhaave, 1668~1738)의 지위에 필적할 만하다고 여겨지던 이들은 독일에서는 이 둘뿐이었다. 호프만은 강의와 실무를 통합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이론 측면에서 기계론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부르하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자였다. 그의 <의학원론>(Fundame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내부링크]
뷔퐁, 생물학 사상과 진화론의 선구자 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은 수학자, 자연학자, 천문학자였고 진화론의 개념적 선구자였다. 뷔퐁은 진화론 사상의 발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독일 학자 칸트(Imanuel Kant, 1724-1804),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독일 지성계에서 생물학 사상이 태동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장 바티스트 피에르 앙투안 드 모네 슈발리에 드 라마르크(Jean Baptiste Pierre Antoine de Monet Chevalier de Lamarck, 1744-1829)와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 [내부링크]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의 <Histoire naturelle, 1749>이 자연사에 대한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 의 관점 및 그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본질적 영향을 행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뷔퐁의 철학적 지지자였던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와 헤르더의 관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헤르더는 1769년 여름 리가에서 낭트로 바다여행을 떠났는데, 이 여행에서 자기 운명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해 12월 파리에서 완성된 〈나의 1769년 여행일지 Journal meiner Reise im Jahr 1769〉라는 책은 그 여행의 영향으로 생긴 변화를 잘 보여준다. 25세의 청년 헤르더는 몇 달 간이나 노르망디(Normandy)에 진을 치고 파리 모험을 위해 마음의 준
바르테즈(Barthez), 블루멘바흐(Blumenbach), 칸트(Kant) : le principe vital1778, Bildungstrieb 1780 [내부링크]
바르테즈(Barthez, 1734-1806) -le principe vital’(생기적 원리) 1778 블루멘바흐(Blumenbach) -Bildungstrieb(형성충동) 1780 칸트(Imanuel Kant, 1724-1804)-Bildungskraft(형성력) 1788, 1790 1778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바르테즈(Paul-Joseph Barthez, 1734-1806)의 대표저서 ‘인간학의 새로운 기초원리(Nouveaux éléments de la science de l’homme, 1778)’에서, 바르테즈 자신의 생기론(vitalism)은 물론이거니와, 생기론(vitalism)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le principe vital’(생기적 원리)’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이는 Stahl(Georges-Ernest Stahl, 1660-1734)의 ‘anima’ 용어의 개념적 오해를 피하면서, 동시에 생리학적(physiologic) 조화의 근거가 되고
Kant and gestation of transcendental morphology(칸트와 초월형태학의 태동) [내부링크]
1781년 칸트(초월철학(transzendentale Philosophie, transcendental philosophy))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시작되어 피히테(절대자아의 주관적 관념론), 셸링(절대자연의 객관적 관념론), 헤겔(주객합일적 절대정신의 절대적 관념론)로 30여년간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Deutcher Idealismus, German idealism)의 사 유의 흐름과 자연철학 사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대 자연철학을 바탕으로 한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을 사상적 기반으로 도출된 epicanthus 논의에서 당대 해부학의 사고틀과 관련된 철학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Epicanthus논의와 관련해서 특히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1869)의 철학적, 해부학적 사상에 영향을 준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
괴팅겐학파(Göttingen School), 생리학적 생기론 [내부링크]
18세기 독일 epigenesis 이론의 발전과정과 이와 관련된 Bildungstrieb, idea of recapitulation의 도출과정을 파악하려면 프랑스 몽펠리에학파(Montpellier school)및 독일 괴팅겐학파(Göttingen School)에 대하여 먼저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Meckel은 괴팅겐학파 Kielmeyer가 제안한 idea of recapitulation(발생반복관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Hemmungsbildung(발달정체)을 도출하였다. 메켈이 착안한 Hemmungsbildung(발달정체)의 기반개념인 idea of recapitulation(발생반복관념)의 도출과정에 생기력(Lebenskraft, vital force) 개념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하고, 18세기 말 epigenesis(후성설) 정립에 중대한 역할을 한 Blumenbach로 대표되는 괴팅겐학파(Göttingen medical school)에서 공부한 학
생물학적 개념을 인간 정신이론(theory of mind)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카루스의 영혼론(psychologie)은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과 공통점이 있다. [내부링크]
생물학적 개념을 인간 정신이론(theory of mind) 혹은 영혼론(psychologie)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 – 1869)의 영혼론(psychologie)은 칸트(Imanuel Kant, 1724-1804) 의 초월적 관념론(transcendental idealism)과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이 인간정신의 작동기전에 관한 ‘정신 해부생리학’이라고 본다면 카루스의 <Psyche: Zur Entwicklungsgeschichte der Seele (1846)>는 인간정신의 태생과정에 관한 ‘정신 발생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중엽 까지의 문헌에서 ‘psychologie’는 심리학이 아니라 영혼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적확하다. <Psyche: Zur Entwicklungsgeschichte der Seele (1846)>의 영어 번
자연의 고고학( archeology of nature), A Daring Adventure of Reason(이성의 대담한 모험) [내부링크]
A Daring Adventure of Reason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순수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제2판(1787)을 위해 고른 제명(epigraph)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Novum Organum(New Organon), 1620>이 포함된 미완의 철학 에세이 전집 <대혁신(Instauratio Magna; Great Renewal)> 서문에서 인용한 긴 라틴어 문장이다. 칸트(Imanuel Kant, 1724-1804) 가 <순수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개정판(1787)을 위한 제명을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에서 고른 것은, 칸트 프로젝트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할 때 이치에 맞는 것이다. 베이컨의 <Novum Organum(New Organon)>은 아리스토텔레스(Ari
18세기에는‘생물학(Biologie, biology)’이 별개의 학문 분야로 존재하지 않았다. [내부링크]
epicanthus 논의의 관점에서, 18, 19세기 자연사의 역사적 측면을 초월형태학 및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아몬의 Epicanthus hypothesis는 그 사상적 배경이 고전적(기술적 의미의) 자연사가 아니라 18세기 말 독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연사(natural history) 사상, 즉 초월형태학이다. 지금까지 Epicanthus hypothesis에 대한 많은 기형학적 관점의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실재적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다시 제기된 적은 없었고, 주된 연구 대상 및 목표였던 epicanthus(몽고주름) 발생원인에 대한 현재의 지식은 ’아직 모른다(still unclear)’이고 초기에 추정된 원인들이 아직도 거의 그대로 검증없이 여전히 관성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epicanthus에 대한 인식론(epistemology)에 대하여 19세기 초 관념 도출의 원점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
독일 자연철학자들의 프로그램은 칸트(Kant)의 초월적 관념론에서 비롯되어 이상적 계획과 같은 초월적 관념이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비칸트적 믿음의 산물이다. [내부링크]
1781년 칸트(Imanuel Kant, 1724-1804) 는 나이 57세에 드디어 자신의 주저 (主著)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을 세상에 내어놓게 된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오랜 철학적 숙고의 산물인 순수이성비판에 한 독자들의 처음 반응은 대체로 냉정했다. 심지어 당시 유력한 학술지던 ‘괴팅겐 비평지’(Göttingischen Anzeigen von Gelehrten Sachen)에는 익명의 독자(Christian Garve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가 쓴 신랄한 혹평이 등장하기도 하다. 칸트는 이러한 많은 비판이 부분 '순수이성비판'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여 1783년에 순수이성비판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서설(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을 출판하게 된다. 많은 오해에도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생각하는 형태학에서 동물의 변태(metamorphosis)란 어떠한 것인가? 칸트와의 견해 차이는? [내부링크]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가 생각하는 형태학에서 동물의 변태(metamorphosis)란 어떠한 것인가. 1790년 Goethe에 의해 다듬어진 변태(metamorphosis)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식물 분석에 먼저 적용되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 1790>에서 영감을 받은 이후의 1795년 연구 저작인 ‘골조직 비교 해부학의 일반 개론에 대한 첫 번째 초고(Erstster Entwurf einer allgemeinen Einleitung in die vergleichende Anatomie ausgehend von der Osteologie, 1795)’에서 Goethe는 동물의 형태학 분석에 동일한 개념을 적용했다. 원형식물(Urpflanze)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동물 원형유형(Urtypus)은 자연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은 비교 경험주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인 도구로서 활용된다. Goethe
1750년대-1770년대 독일 생명과학계와 철학계의 중요 흐름을 지성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면 당대 프랑스 유물론으로부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내부링크]
1750년대-1770년대 독일 생명과학계와 철학계의 중요 흐름을 지성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면 당대 프랑스 유물론으로부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18세기 중반 무렵 독일에서 프랑스식 ‘생기적 유물론(vital materialism)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인 상황(creative reception of French ''vital materialism")을 이해하려면 당시 태동하던 독일 계몽주의(deutsche Aufklärung)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베를린 소재 왕립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Royal Prussian Academy of Sciences)에서의 학술적 흐름에 주목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생기적 유물론(vital materialism) 경향은 18세기 중반 무렵 피에르-루이 모로 드 모페르튀(Pierre-Louis Moreau de Maupertuis, 1698-1759)를 통해 독일 문화계의 심장부인 베를린과 베를린 아카데미(Berli
칸트의 물자체(Ding an sich).....목적론(teleologie), 생물학(Biologie) [내부링크]
칸트(Imanuel Kant, 1724-1804) 가 Hume(David Hume, 1711- 1776) 의 회의주의(skepticism)를 극복하고 주체를 재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은 ‘비판적 관념론(critical idealism)’이다. 칸트 생각으로는 물 자체(Ding an sich)와 현상, 즉 고유의 사물 자체와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맺히는 표상(representation), 이것이 서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우리 인간 능력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칸트의 견해로는 인간은 물 자체(Ding an sich)는 알 수 없고, 현상만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넘는 객관세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형식에 의해 제약된 현상세계일 뿐이다. 1781년 칸트(비판철학, 초월철학)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시작되어 피히테(절대자아의 주관적 관념론), 셸링(절대자연의 객관적 관념론), 헤겔(주객합일적 절대정신의 절대적 관념론)로 30여년간
괴테의 발달형태학,,,,발달정체관념, 몽고주름 [내부링크]
Goethe의 Morphologie : Übergang, Typus 형태학의 창시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와 자연철학의 창시자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은 각자의 관점을 발전시켜 가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였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이 둘은 자신들의 사상을 더욱 명료하고도 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셸링 및 괴테와 괴테의 제자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 – 1869)는 독일 자연철학과 초월해부학 사상의 핵심적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Epicanthus논의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므로 이들의 철학사상 자체 뿐만아니라 사상적 인과관계 또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괴테의 형상 개념의 본질을 통과성 (Übergang, Durchgang, transit)으로 특징짓는 게르트 마텐클로트(Gert Mattenklott, 1942-2009)의 지적은 중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 – 1869)의 <동물해부학 교과서>(Lehrbuch der Zootomie, 1818), 괴테와 카루스 관계의 시작 [내부링크]
브라이트바흐(Breidbach)의 주장을 인용하면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 – 1869)의 <동물해부학 교과서>(Lehrbuch der Zootomie, 1818)는 괴테식 형태학 학설(Goethe’sche Metamorphosenlehre)을 동물 분야(Bereich des Animalischen)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카루스의 저작(Lehrbuch der Zootomie, 1818)은 규모와 세부적인 면에서 동시대 모든 경쟁작들을 능가했고, 그 가치는 2권짜리 영어 번역서로 출간되는 등 비교적 빨리 인정받았다. 영국에서 이 책은 Joseph Henry Green (1791–1863)이 당시 Richard Owen이 다녔던 Royal College of Surgeons에서 비교해부학에 대한 일련의 강의(1828년 이후)의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즉, 카루스는 그린이 교과서로 활용했던 자신의 <동물 해부학 교과서>(Lehrbuch d
괴테의 두개골 척추이론, 형태학 사상의 도출과 전승 [내부링크]
볼크(Louis Bolk, 1866-1930) 의 epicanthus 관념의 기반이 되고있는 "retardation theory(fetalization theory)"의 도출은 독일자연철학(Naturphilosophie)및 초월형태학(transcendental morphology)의 역사적 전승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fetalization theory로 이어지는 idea of Hemmungsbildung의 전승은 두개골척추이론 (theory of vertebral skull)의 학술계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형태학 사상과 두개골 척추이론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1781년 칸트(비판철학, 초월철학)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시작되어 피히테(절대자아의 주관적 관념론), 셸링(절대자연의 객관적 관념론), 헤겔(주객합일적 절대정신의 절대적 관념론)로 30여년간 이어지는 독일관념론의 사유의 흐
Epicanthus(몽고주름), Membrana nictitans(nictitating membrane), Membrana semilunaris(plica semilunaris) [내부링크]
Dr. Schön(셴, 1828), Dr. Ammon(1831 아몬) Epicanthus, Membrana nictitans(nictitating membrane), Membrana semilunaris(plica semilunaris) – 19세기 초 생물학적 개념 정립 시기의 논쟁 그림. nictitating membrane of a masked lapwing(bird) 그림. The plica semilunaris is a small fold of bulbar conjunctiva on the medial canthus of the eye. It functions during movement of the eye, to help maintain tear drainage via the lacrimal lake, and to permit greater rotation of the globe, for without the plica the conjunctiva would attach
게겐바우어(Carl Gegenbaur),,, ,,,,,루게(Rouge), 볼크(Bolk) [내부링크]
Ammon의 1860년 epicanthus 논문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Bildungsfehler))>에 나타나는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dental morphology) 사상은 발생반복관념(idea of recapitulation) 및 발달정체학설(hemmungsbildung Lehre)을 정립한 메켈(Johann Friedrich Meckel, 1781~1833)의 저술 뿐만아니라 자연철학자이자 형태학자인 괴테와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자연철학자이자 초월형태학자 카루스(Carus)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또한 괴테로부터 유래된 카루스의 두개
칸트의 규제적 유기체 목적론, 학으로서 생물학을 부정하다 vs 셸링 자연철학의 구성적 유기체 목적론의 등장, 생물학 사상의 태동을 촉진하다 [내부링크]
근대 유럽의학에서 역사적으로 18 세기 말과 19 세기 초반 생물학 및 발생학 태동기에 가장 중요한 기여는 Blumenbach, Kielmeyer, Meckel, Dollinger, Oken, Pander, von Baer 및 다른 여러 자연학자들이 후성설(epigenesis) 관점에서 발생학 연구를 추구한 독일 의학계에서 이루어졌다. 독일 후성론자들(epigenesists)이 전성설(preformation theory)을 폐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 근거 자체보다 더 근본적 이유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물학적 견해의 철학적 토대가 18 세기 초중반 전임 연구자들의 것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여기서 지적되는 점이 바로 현대의 생명과학 분야 자연과학자들이 이 시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사상(자연사 사상 및 초월적 관념론(혹은 마음의 후성설)) 및 이후 촉발된 수십년간의 독일 관념론(German idealism)(셸링의 자연철학 및 목적론이 포함되
19세기 초 독일 자연철학(Deutscher Naturphilosophie) [내부링크]
1800년 무렵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 과 그 지지자들의 지적 노력에 힘입어 자연철학(Naturphilosophie)은 그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을 확립해 나갔다. 우선 자연철학은 정신과 물질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셸링이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반영하고 있기에, 역으로 정신의 법칙으로부터 자연의 법칙을 유추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이로부터 자연과 정신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의 체계는 동시에 정신의 체계이기도 하며, 자연은 보이는 정신이며 정신은 보이지 않은 자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철학은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 이래 고수되어 온 정신과 물질의 이원성, 그리고 18세기의 물질적 기계론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셀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 이래 자연철학의 또 하나의
idea of recapitulation(발생반복관념), Meckel-Serres law, theory of parallelism(평행이론) [내부링크]
발생반복관념(Idea of recapitulation), 발달정체관념(idea of arrest of development (Hemmungsbildung)), 몽고주름가설(epicanthus hypothesis)은 19세기 초 독일 자연철학(Naturphilosophie)의 형이상학적 패러다임하에 순차적으로 성립된 사변적 가설(speculative hypothesis)들이다. 반복발생관념(Idea of recapitulation)은 1793년 키엘마이어(Carl Friedrich Kielmeyer, 1765-1844)에의해, 발생반복관념에 기반한 발달정체관념(idea of arrest of development(hemmungsbildung))은 1809년 메켈(Johann Friedrich Meckel, 1781 – 1833)에 의해, 발달정체학설에 기반한 몽고주름가설(epicanthus hypothesis)은 1831년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
퀴비에의 1807년 질문편지에 대한 키엘마이어의 답신 [내부링크]
퀴비에의 1807년 질문편지에 대한 키엘마이어의 답신 1793년 2월 11일 슈투트가르트 칼스슐레(Stuttgart Karlsschule)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간된 킬마이어(Carl Friedrich Kielmeyer, 1765-1844)의 강연 <일련의 다양한 조직체에서 유기적 힘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법칙 및 결과에 대하여>(Über die Verhältnisse der organischen Kräfte untereinander in der Reihe der verschiedenen Organisationen, die Gesetze und Folgen dieser Verhältnisse, 여기서 ‘조직체(Organisationen)’은 ‘생명 형태[life-forms]’를 말함)는 독일 철학 및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강의는 킬마이어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3년간의 자신의 강의를 파편적이고도 고급 수준으로 요약한 것에
17세기에 의학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라틴어 ‘evolutio’ 및 영어 'evolution'의 의미역(semantic field) 변화 [내부링크]
17세기에 의학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라틴어 ‘evolutio’는 발생학 이론(embryological theory) 가운데 배아(embryo)가 처음부터 미니어처 성체(miniature adult)를 품고 있어 발생(gestation)과정에서 이 형태가 전개(펼쳐짐) 내지는 ‘발달(evolved)’한다는 전성설(preformationism)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의미는 1850년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에 의해 의미지어지고 대중화된 것으로 여겨지며 변이(modification)를 동반한 종 계보(species descent)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틴어 ‘evolutio’에 담겼던 과거의 발생학적(embryological) 전성설 관념이 두 세기를 거치면서 종 변화(species change)를 가리키는, 현대 독자들에게 익숙한 의미를 담은 영어 ‘evolution’으로 변모하면서도 과거의 흔적을 얼마간 유지하고 있다. 영어 ‘theory of e
존재의 거대한 사슬의 시간화(temporalization of the great chain of being) : 생물학 사상의 태동 [내부링크]
존재의 거대한 사슬 idea of great chain of being(scala naturae)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scala naturae(자연의 사다리)는 형태(form)의 복잡성에 따른 위계 구조(Aristotle's hierarchy)로 모든 생물체를 정렬하였는데, 인간은 계층 구조 최상위에 자리한다. 그림. Aristotle’s scala naturae 20세기에 Darwin(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descent theory)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중세 이후 유럽인들의 자연관은 기본적으로 Aristotle의 Scala Naturae 즉 ‘존재의 거대한 사슬(Great Chain of Being)’ 관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The mediaeval scala naturae as a staircase, implying the possibility of progress. Ra
생리학(physiologie, physiology), 생물학, 의학역사 [내부링크]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계 생명체들을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들로서 전체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Biologie(Biology)는 Physiologie(physiology)와 comparative anatomy의 발전 및 제반과학과 철학사상의 진전속에 그 지식의 융복합체로서 19세기초에야 비로소 도출된 유기체의 인식체계이다. 생명체의 작동원리를 탐구하는 생리학(physiologie)의 학술적 기원은 B. C 4세기 Hippocrates의 theory of the four humors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 철학의 전통과 궤적을 같이하는 오랜 학문분야이다. 현재의 "physiologie(physiolog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는 16세기 프랑스 의사 Jean Fernel (1497-1558)이다. 그는 "study of nature, origins"를 뜻하는 그리스어 physis와 logia를 합성하여 physiology를 명명하였다. 이후 physiology는 Harvey
Carl Friedrich Kielmeyer, 1765-1844)(키엘마이어) [내부링크]
키엘마이어(Carl Friedrich Kielmeyer, 1765-1844)의 핵심 사상은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 – 1803) 의 <인류역사의 철학을 위한 이념>(Ideas for the Philosophy of the History of Humanity[독일어 제목은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제 1편 117~126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Kielmeyer의 혁신적 사상에는 분명히 헤르더의 영향이 지대했다. 칸트의 버려진 제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는 <인류역사의 철학을 위한 이념,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1784-1791 (Ideas for a philosophy of the history of mankind)>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
괴테의 자연개념 및 형태학 사상 : typus, Morphologie, Metamorphosis [내부링크]
19세기 독일 의학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독일어 ‘typus(유형)’의 학술적 의미를 시대적 맥락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연학자로서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의 사상, 특히 그의 형태학(Morphologie)에 대하여 먼저 고찰해보아야 한다.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문호 괴테는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82년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경지의 예지를 터득했다고 평해진다. 만년에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그가 살던 작은 도시 바이마르를 신·구 대륙으로부터의 순례자들의 끊임없는 행렬이 쇄도하는 성지가 되었다고 한다. 괴테는 세계적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생명과학 분야에서 " Morphologie, morphology"라는 용어로 기억되는 형태학자이자 자연철학자로 불리기도 한다. 탄티요(Astrida Orle Tantillo)는 괴테를 “자연철학자(natural philosopher)”라고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 – 1803)의 자연사 사상 [내부링크]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 – 1803) 가 전반적으로 주창했던 자연사에서 우주론적(cosmological) 측면은 칸트(Imanuel Kant, 1724-1804)로부터 배운 것이었고 생물학적 사상은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과 카스파르 프리드리히 볼프(Caspar Friedrich Wolff, 1733-1794)로부터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복잡성과 분화의 증가(increasing complexity and differentiation)를 자연 발달의 내재적 원칙 (immanent principle of natural development) 이자 형이하학적 세계(physical world) 전체가 지닌,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특성/경향이라고 여겼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가지 상태가 나아가면 다른 상태가 나타나고 준비된다.” “자연에는 가만
연속성 원리 (principle of continuity), 라이프니츠 (Gottfried Leibniz, 1646-1716) [내부링크]
연속성 원리(principle of continuity),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z, 1646-1716) 레벤후크(Anton van Leeuwenhoek, 1632-1723)의 연구는, 다른 중요 현미경 사용 연구자(microscopists) 두 명, 얀 슈밤메르담(Jan Swammerdam)과 마르첼로 말피기(Marcello Malpighi)의 연구와 아울러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z, 1646-1716)에게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라이프니츠에게는 레벤후크의 1674년의 연못물 한 방울에 가득한 생명(life teeming in a drop of pond water)의 발견이 로크(John Locke, 1632-1704)나 뉴튼(Isaac Newton, 1642-1727)이 지지하는 자연관(view of nature)에 도전하는 형이상학 체계(metaphysical system)에 대한 경험적(empirical)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
Haeckel(Ernst Haeckel, 1834-1919) 헤켈 [내부링크]
Epicanthus hypothesis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 전제는 ‘idea of recapitulation’을 원리로 성립된 후성설적 발생학 및 ‘idea of Hemmungsbildung(arrested development)’을 원리로 성립된 기형학으로서 둘다 19세기 초반 메켈(Johann Friedrich Meckel, 1781~1833)이 정립한 것이다. 이 중 ‘idea of recapitulation’은 가장 기초를 이루는 사변적 가설(speculative hypothesis)이었고, 이 발생학적 논리가 지지되지 못하면 ‘Hemmungsbildung Lehre’ 와 ‘epicanthischen Lehre(epicanthus hypothesis)’도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epicanthus hypothesis’의 지탱에 ‘idea of recapitulation’의 학술적 유지는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켈 기형학, 병리해부학에 대한 편람(Handbuches fur pathologische Anatomie, 1812-1818) [내부링크]
아몬은 1860년 논문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에서 Epicanthus의 발생원인을 발달저지학설(혹은 발달정체학설, Hemmungsbildung Lehre)로 추정하였다. 19세기 중반 당시 기형학의 기준으로 여겨지던 해부학자 메켈(1781-1833)은 기형(Missbildung, malformation)을 독일어 „ Bildungsfehler (발달오류)“ 또는 „ Fehler der Urbildung (본래의 발달상의 오류)“이라고 명칭했었다.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 논문의 참조문헌에 메켈의 기형학 대표저서 <Handbuch der pathologischen Anatomie
메켈의 할레대학 스승인 라일의 생기력에 대한 입장 선회(자연철학 진영으로)를 살펴봄으로써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독일 대학의 자연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다. [내부링크]
3대에 걸친 정통 해부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메켈(Johann Friedrich Meckel, 1781~1833) 은 ‘German Cuvier’라고 불릴만큼 당대 독일 최고의 비교해부학자였고, 그가 집필한 ‘병리해부학에 대한 편람(Handbuches fur pathologische Anatomie1812-1818)’은 19세기 한세기 동안 기형학의 표준서가 되었을 정도로 기형학의 선구자이기도했다. 메켈은 스스로 당대 자연철학(Naturphilosophie)의 ‘사변 남용(abuse of speculations)’에 거리를 두었던 정통 해부학자였고, 메켈이 편집자(1815-1832)였던 Deutsches Archiv fur Physiologie는 관찰과 실험에 그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메켈의 해부학 사상은 발생반복관념 및 발달정체기형관념이 포함된 삼중평행이론으로 인해 청년기부터 이미 ‘낭만주의 자연철학(Romantic Naturphilosophie’과 깊숙히 연관되어있었다
트레비라누스(Gottfried Reinhold Treviranus, 1776~1837)의 생물학(Biologie, 1802) [내부링크]
트레비라누스(Gottfried Reinhold Treviranus, 1776~1837)의 생물학(Biologie, 1802) 저작은 괴팅겐 학파 자연학자들(Göttingen school naturalists)에 의하여 내용을 갖추고 자연철학계(Naturphilosophie)에 의하여 발전한, 유기체에 대한 일반적 개념 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가장 충실히 집대성한 예시라 할 만하다. 트레비라누스(Gottfried Reinhold Treviranus, 1776~1837) 가 유기체의 자기 조직화 프로세스(self-organizing process of organism)를 역사적 과정, 즉 점진적인 역사적 발달(gradual historical development)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저작이다. Treviranus, G. R. (1802). Biologie, oder Philosophie der lebenden Natur für Naturfo
몽고주름 (epicanthus, epicanthal fold))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철학자는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이다. [내부링크]
18세기 말 독일 자연철학(Naturphilosophie)에서는 칸트 초월철학(transzendentale Philosophie, transcendental philosophy)의 대안으로서 형이하학(physical sciences)에서 말하는 물질(matter)과 힘(force) 간 관계를 재구성하여 형이하학적 세계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 창발성(emergence)과 프로세스(process)가 그 자체로서의 자연(nature in itself)이라는 발상이 자연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은 본질적으로 창조적(creative)이다. 자연 내 자기 생성(self-production)은 간단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옮겨가며 역사·발달적(historical-developmental)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당대 생명과학계는 몇 가지 확정적 산물(products)로부터, 이를 만들어 낸 내재적 프로세스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었다. 스피노자(Spinoza)가 말한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 [내부링크]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 영국의 의학자이며 생리학자인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는 1651년 런던에서 『동물의 출생에 관하여(On the generation of animals)(Exercitationes de generatione animalium)』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 소개된 수정(conception)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주장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였다. 하비는 1628년 『동물의 심장운동과 혈액운동에 관한 연구(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를 출판하여, 혈액 순환설을 최초로 주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해부학(解剖學, anatomy)은 기원전 2세기 로마의 의사였던 클라우디우스 갈레누스(Claudius Galenus, 갈렌, Galen, 129-216)로부터 시작되었다.
괴테의 동물 형태학 연구 <골학 비교 해부학의 일반 개론에 대한 첫 번째 초고> [내부링크]
해부학자 Carus(Carl Gustav Carus, 1789 – 1869), Haeckel(Ernst Haeckel, 1834-1919) 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Goethe(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metamorphosis 개념에 대한 의미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동물 형태학(animal morphology)에 관한 괴테의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vital force 및 organization에 관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와 괴팅겐학파(Göttingen school)와의 관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1790년 Goethe에 의해 다듬어진 변태의 개념(concept of metamorphosis)은 본질적으로 식물의 변화하는 형태 분석(analysis of the changing forms of plants)에 적용되었었다. 이후의 연구인 ‘골학 비교
Bildungsfehler : 메켈의 기형학과 기형분류 [내부링크]
아몬은 1860년 논문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 가지 발달오류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F. A. von Ammon,1860>’에서 Epicanthus의 발생원인을 발달저지학설(혹은 발달정체학설, Hemmungsbildung Lehre)로 추정하였다. 19세기 중반 당시 기형학의 기준으로 여겨지던 해부학자 메켈(1781-1833)은 기형(Missbildung, malformation)을 독일어 „ Bildungsfehler (발달오류)“ 또는 „ Fehler der Urbildung (본래의 발달상의 오류)“이라고 명칭했었다.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 논문의 참조문헌에 메켈의 기형학 대표저서 <Handbuch der pathologischen Anatomie
발생이론 (칸트, 셸링, 카루스) [내부링크]
Is it possible, Kant asked, that "some individual members of the plant and animal kingdoms, whose origin is indeed directly divine, nonetheless possess the capacity, which we cannot understand, to actually generate [erzeugen] their own kind in accordance with a regular law of nature, and not merely to unfold [auszuwickeln] them?" (2:114). 칸트(Imanuel Kant, 1724-1804)는 형이상학(metaphysics) 강의에서 후성설이 혼합된 자손(blended progeny)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요한다는 전제 하에 전성설(preformation theory)의 상대적 장점을 후성설과 비교하여 제시
조프루아(Étienne Geoffroy Saint-Hilaire, 1772 – 1844), 프랑스 초월해부학 [내부링크]
Epicanthus(몽고주름) 논의의 관점에서 프랑스 해부학자 조프루아(Étienne Geoffroy Saint-Hilaire (1772 – 1844))는 독일 Naturephilosophie 및 transzendentale Morphologie와 영국의 transcendental anatomy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프랑스 초월해부학(anatomie transcendantale)의 대표적 학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술적 경로를 통해 독일 ’자연철학(Naturephilosophie) 및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의 핵심 관념들인 Rekapitulation(recapitulation), Hemmungsbildung(arrested development) 등이 영국의 Knox(Robert Knox, 1791-1862)로 전파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스코틀랜드인 해부학자(Scottish anatomist)인 Athur Kei
Vitality as valeur opératoire (관념 조작 도구로서의 생기론) [내부링크]
Vitality as valeur opératoire(metaphor, analogy) 애초부터 정의 자체가 어려운 ‘생명’에 관한 연구에서 관념(idea)은 변화가능한 도구일 뿐이며 실험과 관찰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과 생명과학 역사에서 현실적인 제반과학의 한계로 인해 실험과 관찰로 실증할 수 없는 학술적 난관을 임의적 추론과 가정으로 메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작도구 (valeur opératoire, operational value)로서의 ‘관념’ 도입은 종국적으로 그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닐지라도, 다음 단계로의 학술적 추론에 도움이 되었던 측면을 반영해서 학술적 의의를 평가해야하고, 설령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비판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가설적, 잠정적 개념은 추후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실재론(realism)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는 물리화학적 속성들로
"On the Problem of Anthropogenesis." By Prof. L. BOLK. 볼크, 인간화의 문제 1926 [내부링크]
Bolk는 1918년 암스테르담 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시기에 기사작위을 받았는데, 이 때 그는 처음으로 ideas of fetalization에 대하여 밝혔다. 이 이론은 1925년 Freiburg에서 열린 Anatomical Congress에서 발표되어 완전히 설명되었고 이듬해인 1926년에 <“Das Problem der Menschwerdung,” in 25sten Versammlung der anatomischen Gesellschaft in Freiburg (Jena, 1926)>으로 출간되었다. 이 이론에서 인간은 neotenic ape인 것으로 간주돠고, 성인에서 나타나는 많은 태아성 특성의 유보(retention)가 내분비계 호르몬에 의해 야기된다고 말한다. 이 이론은 어떤면에서 유인원은 인간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더 전문화(specialized)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어린 ape에서 과도기적인 많은 특징이 인간 발달에서는 지속된다고 주장한 이 "retardati
교과서, 중요 논문들의 epicanthus 내용, Hemmungsbildung(arrested development) [내부링크]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 1860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의 1860년 독일어 논문 <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haut>[bk2] 에는 epicanthus의 병인(Die Entstehung des Epicanthus, etiology of epicanthus)으로서 Hemmungsbildun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이제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Epicanthus의 발생시기로 두 가지 태아 발달기간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초기로, 크고 정교한 Epicanthus가 두개골 발달의 결함과 함께 생기는 때이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작은 epicanthische Falte들이 생
Carus, 1838 System der Physiologie [내부링크]
https://archive.org/details/systemderphysio00carugoog/page/n120/mode/2up?q=evolution System der Physiologie umfassend das Allgemeine der Physiologie; die physiologische Geschichte der Menscheit, die des Menschen und die der einzelnen organischen Systeme im Menschen, für Naturforschen und Aerzte : Carus, Carl Gustav, 1789-1869 : Free Download, Borrow, and Streaming : Internet Archive Book digitized by Google from the library of Oxford University and uploaded to the Internet Archive by user tpb. a
On the Origin of human Races By BOLK. [내부링크]
Bolk(Louis Bolk, 1866-1930) 의 1927년 논문을 보면 당시의 인종에 대한 잘못된 생물학적 편견과 이에 바탕한 epicanthus에 대한 Bolk의 학술적 견해를 알 수 있다. <Anthropology. - On the Origin of human Races. By Prof. L. BOLK. (Communicated at the meeting of March 26. 1927), Proceedings of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volume 30, nummer 2 (1927) 320-328>의 내용을 살펴보자. 볼크의 1926년 논문 및 1927년 논문을 보면 당시의 인종에 대한 다원론적 생물하적 편견과 이에 바탕한 epicanthus에 대한 볼크의 학술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1927년 발표된 <On the Origin of human Race>[bk8] 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
존슨의 1956년 epicanthus 논문 [내부링크]
‘Plastic surgery (McCarthy 1990)’는 성형외과 교과서 중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2013년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교과서이다. Epicanthus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속한 Chapter 34. Reconstruction of the eyelids and associated structures의 references에는 Ammon, Duke-Elder의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Duke-Elder classification을 인용하고 있는 Johnson의 1956년 논문 <Operations for epicanthus and blepharophimosis : An evaluation and a method for shortening the medial canthal ligament> 만이 포함되어 있다. ‘Plastic surgery (McCarthy 1990)’에는 이전 성형외과 교과서인 Converse의 Recon
프리차드, 로렌스 : 녹스 이전 19세기 초 영국의 인종관념 [내부링크]
우리는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이 활동하던 시기를 포함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초기 생물학 사상, 초월형태학 및 인간 과학(human sciences, 당시의 용어로는 인간 자연사)의 태동과 발전이 본격적인 인종 논쟁(race debate, 일원설과 다원설)에서 결정적 요소였던 점을 기억하고 인종 및 epicanthus에 대한 논의에 접근해야한다. 18세기와 19세기의 대부분 자연학자들은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지위에 관해서 인종의 위계를 어느정도 가정했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도 확실히 인종적 위계(racial hierarchy)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인종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진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해부생리학자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와 Friedrich Tiedemann(1781-1861)
낸시 스테판(Nancy Stepan)의 Keith 비판 [내부링크]
Epicanthus와 관련된 Keith(Arthur Keith, 1866-1955)에 대한 논의에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학자 Keith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저작을 통해 이 당시 인류학의 패러다임과 Keith의 다원론(polygenism)적 인류학적 관점에 대하여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낸시 스테판(Nancy Stepan)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The idea of race(1982)’에 Keith의 당대 다원론자로서의 입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Some evolutionists were uncomfortable with the polygenist label. Keane, for instance, denied he was one. The differences between races might be great, but all races shared a common ancestor; extreme polygenism would, after a
엘리 메치니코프 Élie Metchnikoff [내부링크]
엘리 메치니코프(프랑스어: Élie Metchnikoff, 러시아어: Илья́ Ильи́ч Ме́чников 일리야 일리치 메치니코프) (1845-1916) 하르키우(하리코프) 대학교(Kharkiv Imperial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독일 기센 대학교(University of Giessen, 1864), 괴팅겐 대학교(University of Göttingen, 1865-1867)에 유학하였다. 1870년 오데사 대학교 Imperial (Novorossiya University (Odesa University)) 교수를 거쳐, 1888년에는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 들어가 루이 파스퇴르 밑에서 세균학과 면역학을 연구하였다. 19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1874년 러시아 생물학자Metschnikoff(Élie Metchnikoff, 1845-1916)는 자신의 독일어 논문 <E. Metschnikoff. Über die Beschaffenheit der A
체임버스, 녹스 , Robert Chambers, Robert knox [내부링크]
1913년 Epicanthus를 영어 발생학 교과서에 처음으로 기술한 케이스(Arthur Keith, 1866-1955)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19세기 전반기 프랑스 초월형태학자 조프루아(Étienne Geoffroy Saint-Hilaire, 1772–1844)의 제자이자 영국의 대표적 초월해부학자(transcendental antomist)였던 녹스((Robert Knox, 1791-1862)가 이들 단어들, 즉 arrested development, idea of recapitulation 등의 초월 해부학의 핵심개념들을 처음으로 번역하여 영국에 도입했던 학자였다고 기술하였다. 케이스의 1911년 논문 ‘Aantomy in Scotland during the lifetime of Sir John Struthers (1823-1899)’에서 Knox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녹스가 rudimentary structures, arrested development, recapitulati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1796~ 1866) [내부링크]
그림. 아몬이 인용한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1796~ 1866)의 ‘Nippon(1832)’에 수록된 원본 삽화 p299; 1.일본인(jungen Japaners) 2.한국인(jungen Koreaners) 3.중국인(Chinesen) 4.말레이인(Malaischen) 5.일본인 눈의 설명을 위한 스케치 6.보르네오인(Borneo), Nr. 1 ist das Auge eines jungen Japaners dargestellt und dessen Bau durch die in Nr. 6 gegebene Skizze nachgewiesen: a, b, c zeigen die Hautfalte des oberen Augenlides, wie sie sich am inneren Augenwinkel (bei c) über das untere Augenlid herabzieht. Der Augenknorpel d zieht sich bei
epicanthus 명칭 : epicanthal fold, mongolian fold, 몽고주름, 내안각췌피, 눈구석주름 [내부링크]
Epicanthus를 표현하는 국어 의학용어는 2001년 우리말 ‘눈구석주름’으로 개정되기 전 ‘내안각췌피(內眼角贅皮)’였다. ‘贅,췌’는 혹, 불거져나온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內眼角贅皮는 독일의학을 아시아권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일본 해부학자들이 20세기 초엽에 붙인 번역 명칭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 명칭이 epicanthus를 의미하는 의학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內眼角贅皮(내안각췌피)는 ‘눈구석덧살’의 의미이고 ‘주름’의 의미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일본학자들은 동양인에게 epicanthus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번역함에 있어 용어작성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동양인 눈머리에 해부학적으로 주름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동양인의 내안각주위 윗눈꺼풀에 육안해부학상 뚜렷한 진성 주름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육안해부학적으로 동양인의 윗눈꺼풀에 쌍꺼풀 주름(palpebral fold)외에는 해부학적 명칭을 따로 주
19세기 독일 문헌에 사용된 ethnographie, ethnologie, ethnologische, Rasse [내부링크]
아몬의 1860년 논문 <epicanthus와 epiblepharon, 인간 안면피부의 두가지 기형(Der Epicanthus und das Epiblepharon, zwei Bildungsfehler der menschlichen Gesichtshaut‚ Ammon 1860)>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면, 19세기 독일 문헌인 1860년 아몬(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 – 1861)의 논문에 사용된 ethnographie, ethnologie, ethnologische라는 독일어 단어는 현재의 ‘문화적 측면의 인구집단적 민족학’이라는 의미 보다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구분되는 종족학 혹은 인종학’의 의미로 해석해야하고, 이 시기 독일어 Rasse(인종, 종족)는 현재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생물학적 분류군으로서의 인종 개념과는 달리, 19세기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e Morphologie, transcen
귀납의 동조(consilience of induction) [내부링크]
휴얼(William whewell)이 말하는, “귀납의 동조(consilience of induction)는 한 부류의 사실로부터 얻어진 귀납이 다른 부류의 사실에서 얻어진 귀납과 일치할 경우에 일어난다, 이러한 동조는 그것이 일어나는 이론의 진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다.” 귀납의 동조는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반화를 그보다 포괄적인 이론에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가설을 과학적 이론으로 수락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귀납의 동조를 가져오는 가설은 별개의 종류로 보였던 데이터를 하나의 종류로 환원해주는 가치를 지닌다. 본문에서 기술할 여러 evidences에 의해 Asian eyelid에 대한 ‘’presence of epicanthus’라는 false premise는 명백히 부정된다. 또한 최근의 terminal fibers of levator aponeurosis의 EM finding과 surgical experience를 반영하면, 동양인 눈꺼풀의 palpebral fo
Subspecies, Mayr와 Ashlock (1991 )의 개념 [내부링크]
Subspecies에 대한 정의로는 Mayr와 Ashlock (1991 )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있다. [u1] subspecies의 개념은 동일한 species이고 교배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지리적 환경적 격리로 인해 외형적 차이가 있는 것을 분류하는 것이다. Darwin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종과 아종(subspecies)의 진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u2] [u1]: “A subspecies is an aggregate of phenotypically similar populations of a species inhabiting a geographic subdivision of the range of that species and differing taxonomically from other populations of that species.” In general, subspecies can be considered a defined in
Thomas Samuel kuhn의 패러다임 개념(paradigm concept)과 몽고주름 가설(epicanthus hypothesis) [내부링크]
Thomas Samuel kuhn's paradigm concept and paradigmatic approach to idea of epicanthus Asian eyelid에 대한 현재의 해부학적 개념(current anatomical concept)을 인식론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Ammon(Friedrich August von Ammon, 1799–1861)의 epicanthus hypothesis의 역사적 성립과정 및 전승 분석에 Thomas Samuel kuhn(1922-1996)의 패러다임 개념(paradigm concept)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picanthus hypothesis는 19세기 초 독일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이 관념론적 자연철학(Idealistische Naturphilosophie)의 영향아래 도출된 초월형태학(transzendental Morphologie)일 때 제안된 가설이다. 당대 학자들의 사고틀을 이루
10. Epistemology of Epicanthus and Epiblepharon resulting in Epicanthoplasty and Blepharoplasty [내부링크]
Dichomatous epistemology of Epicanthus and Epiblepharon resulting in Epicanthoplasty and Blepharoplasty 1. idea of epicanthus and epiblepharon in anatomy of Asian eyelid based on transcendental morphology 2. Rhinoraphe and Blepharectomie/Bildung einer künstlichen Hautfalte(epicantho-plasty and epiblepharon-plasty), dichomatous treatment by Ammon : inevitable consequence of dichomatous epistemology of epicanthus and epiblepharon 3. Japanese modern medicine before World War II and Sayoc's plagiari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