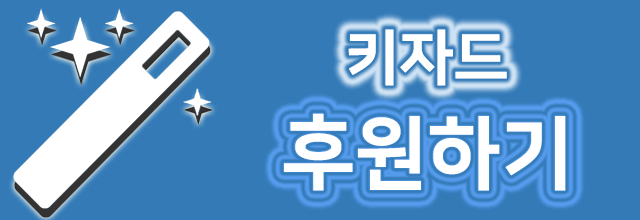seoulb의 등록된 링크
seoulb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2건입니다.
명황계감언해(明皇誡鑑諺解) [내부링크]
명황계감언해(明皇誡鑑諺解) 명황계감(明皇誡鑑)은 조선 세종이 1441년(세종 23년)에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에 고금(古今)의 시를 덧붙여 엮은 것이고, 이를 세조와 최항 등의 신하들이 1464년(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한 것이 명황계감언해(明皇誡鑑諺解)이다. 내용은 미색에 탐닉하다가 정사를 등한시하고 국가를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했던 행태를 그리고 있다.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소장되어 있다.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 [내부링크]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406년에 부처의 설법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말하며,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한다.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는 묘법연화경을 송나라 때 계환(械環)이 요점을 해설하고 명나라 일여(一如)가 주석을 단 집주본(集註本)을 1463년에 세조가 구결(토씨)를 달고, 불교경전을 번역하던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법화경’을 한글로 번역한 다음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7권 7책). 즉, 부처의 설법을 기록한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묘법연화경언해(법화경언해)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법화경(法華經)’은 대부분 송나라 계환(戒環)이 1126년에 저술한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7권본이다. 이 계환본은 최이(崔怡)의 명으로 사일(四一)이 입수하여 고려 후기에 들어왔는데, 1240년(고종 27) 작성된 최이의 발문이 수록된 첩장본이 현전 最古의 것
등고(登高) [내부링크]
1. 등고(登高)는? 싸늘한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높은 언덕에 올라 늙고 병든 몸으로 슬픔을 한 잔 술로 달래면서 가을의 적막함과 자신의 서정을 구슬프게 읊은 작품으로 두보가 56세 때인 767년에 지은 시이다. 2. 등고(登高) 원문 風急天高猿嘯哀 (풍급천고원소애) 渚淸沙白鳥飛廻 (저청사백조비회) 無邊落木蕭蕭下 (무변낙목소소하) 不盡長江滾滾來 (부진장강곤곤래) 萬里悲秋常作客 (만리비추상작객) 百年多病獨登臺 (백년다병독등대) 艱難苦恨繁霜鬢 (간난고한번상빈) 燎倒新停濁酒杯 (요도신정탁주배) · 登高 : 높은 동산에 오르다. 음력 9월 9일은 重陽節(중양절)인데 이날 登高(등고)하여 酒宴(주연)을 베풀고, 국화주를 마시고 茱萸(수유)를 머리에 꽂고 年中의 厄(액)을 拂拭(불식)하는 古俗(고속)이 있다. 이 시는 767년 가을 夔州(기주)에서 重陽節을 맞아 높은 樓臺(누대)에 올라가 가을철의 정경을 서술하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늙어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읊은 것이다. · 猿嘯哀 :
구전설화(口傳說話)·구비설화(口碑說話) [내부링크]
구전설화(口傳說話)=구비설화(口碑說話) 설화(說話)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모든 설화는 신화와 전설과 옛이야기(민담)로 나뉜다. 1. 신화(神話) 신화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 특히 우주 ·인간 ·문화(사물)와 같은 인간생활에 있어 본질적 의미를 갖는 존재의 시원(始源)에 관한 설화이다. 2. 전설(傳說, saga, legend) 전설은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큰 전쟁이나 큰 사건과 같은 실제 사실에 관한 설화이다. 가장 유명한 예로서 트로이 전쟁의 전설이 있다. 이처럼 전설은 신화와는 달리 태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와 현재와의 사이의 어느 한 시기에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지는 인물이 특정한 장소에서 벌인 사실을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은 신화처럼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약하고, 또한 성스러운 성격이 부족하며, 현실에 대한 규제력에 있어서도 모자란다. 반면에 구
낙랑공주 (樂浪公主) [내부링크]
- 쉽고 흔하게 쓰면서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상 낙랑공주라는 이름은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흔히 들었던 낙랑공주 두 명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1] 하나의 낙랑공주 (樂浪公主) 하나는 낙랑국의 왕인 최리의 딸로 이는 호동왕자와의 비련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낙랑공주이다. 널리 쉽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다시금 정리해 보기로 한다. 호동(好童)은 고구려 유리왕의 셋째 아들인 대무신왕의 차비(次妃)에게서 태어난 소생이다. 호동왕자는 서기 32년 4월 옥저로 놀이를 나갔다가 낙랑국의 왕 최리(崔理)를 만난다. 낙랑국의 왕 최리는 호동의 기개와 용모에 반하여 호동을 데리고 낙랑국으로 간다. 최리왕은 호동에게 낙랑공주를 보여주었다. 호동도 낙랑공주가 마음에 들어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은 부왕(父王)인 대무신왕에게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게 해 달라고 하였다. 부왕(父王) 은 고심 끝에 그 결혼을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 [내부링크]
1.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은?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가 59세 때인 770년에 지은 칠언 절구의 시이다. 2.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 원문 岐王宅裏尋常見 (기왕택리심상견) 崔九堂前幾度聞 (최구당전기도문) 正時江南好風景 (정시강남호풍경) 落花時節又逢君 (낙화시절우봉군) · 江南(강남) ; 양자강 이남 지역, 이 시에서는 湘水(상수)유역 · 岐王(기왕) ; 당 현종의 동생 李範(이범) · 崔九(최구) ; 최씨 집 9째 아들 · 正是(정시) ; 때 마침, 참말로 · 風景(풍경) ; 경치란 뜻이 아니라 바람과 햇빛. 3. 번역(15세기 국어) 4. 현대어 풀이 기왕의 집 안에서 늘 보았더니 최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을 들었느냐 참으로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는구나. 5. 작품개관 작자 : 두보(杜甫, 712~770) 갈래 : 한시, 칠언 절구 연대 : 두보가 59세 때(770년) 성격 : 애상적,회고적 표현 : 대구법, 대조법 제재 : 이구년(당의 현종
강촌(江村) [내부링크]
1. 강촌(江村)은? 두보가 49세 때 성도에서 지은 작품이다. 1481년(성종 12년) 간행된 '분류두공부시언해'(일명 두시언해)에 한국어로 번역(언해)되어 실려 있다. 2. 강촌(江村) 원문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 포촌류)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 사사유) 自去自來堂上燕 (자거자래 당상연)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 수중구)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 위기국)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 작조구)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 유약물)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 갱하구) 一曲(일곡) : 한 굽이 幽(유) : 고요하고 그윽함 自去自來(자거자래) : 자유롭게 들락날락함 相親相近(상친상근) : 친근하여 가까이 다가옴 棊局(기국) : 바둑판 釣鉤(조구) : 낚시바늘 微軀(미구) : 보잘 것 없는 몸 3. 번역(언해) 4. 현대어 풀이 맑은 강 한 구비 마을을 안고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도다 저절로 가며 저절로 오는 집 위의 제비여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기가 물 가운데 갈매기로구나 늙
고도호총마행(高都護 驄馬行) [내부링크]
1. 고도호총마행(高都護 驄馬行)은? 두보가 38세 때인 749년에 오랑캐를 치고 돌아온 고선지(高仙芝) 장군의 애마를 칭송하며 지은 시.[1] 고선지는 고구려 사람으로, 나라가 망하자 당나라로 들어와 장수가 되었으며, 안서 부도호(安西副都護)와 사진도지병마사(四鎭都知兵馬使)에 올랐다.[2]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에 한국어로 번역(언해)되어 실렸다. 2. 고도호총마행(高都護 驄馬行) 원문 安西都護胡靑驄 (안서도호호청총) 聲價忽然來向東 (성가홀연래향동) 此馬臨陣久無敵 (차마임진구무적) 與人一心成大功 (여인일심성대공) 功成惠養隨所致 (공성혜양수소치) 飄飄遠自流沙至 (표표원자유사지) 雄姿未受伏櫪恩 (웅자미수복력은) 猛氣猶思戰場利 (맹기유사전장이) 腕促蹄高如踣鐵 (원촉제고여북철) 넘어질 북 交河幾蹴層氷裂 (교하기축층빙열) 五花散作雲滿身 (오화산작운만신) 萬里方看汗流血 (만리방간한류열) 長安壯兒不敢騎 (장안장아부감기) 走過掣電傾城知 (주과체전경성지) 靑絲絡頭爲君老 (청사락두위군
귀안(歸雁) [내부링크]
1. 귀안(歸雁)은? 두보가 안록산의 난으로 유랑생활을 하던 53세 때(764년) 피난지인 성도(成都)에서 지은 작품이다. 1481년(성종 12년) 간행된 ‘분류두공부시언해’(일명 두시언해)에 실린 내용이다. 봄이 되어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난리로 인해 시인은 고향을 두고도 돌아갈 기약이 없다. 그러기에 시인은 봄이라는 계절에서 남 모를 향수를 느끼고 이러한 서글픈 정한을 철새인 기러기에 첩첩이 실어 읊고 있는 것이다. 2. 귀안(歸雁) 원문 春來萬里客 亂定幾年歸 斷腸江城雁 高高正北飛 · 萬里客(만리객) : 고향으로부터 만리나 떨어져 유랑하는 나그네 · 亂定(난정) : 전란(안록산의 난)이 그침. · 幾年(기년) : 어느 해에. 어느 때에. · 腸斷(장단) : 간장이 끊어지다. 애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 · 高高(고고) : 아주 높이 · 正(정) : 옳게. 똑바로. 3. 언해 4. 현대어 풀이 봄에 와 있는 만 리 밖의 나그네는 (객지에서 봄을 맞는 나그네) 난이 그치거든
등고(登高) [내부링크]
1. 등고(登高)는? 싸늘한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높은 언덕에 올라 늙고 병든 몸으로 슬픔을 한 잔 술로 달래면서 가을의 적막함과 자신의 서정을 구슬프게 읊은 작품으로 두보가 56세 때인 767년에 지은 시이다. 2. 등고(登高) 원문 風急天高猿嘯哀 (풍급천고원소애) 渚淸沙白鳥飛廻 (저청사백조비회) 無邊落木蕭蕭下 (무변낙목소소하) 不盡長江滾滾來 (부진장강곤곤래) 萬里悲秋常作客 (만리비추상작객) 百年多病獨登臺 (백년다병독등대) 艱難苦恨繁霜鬢 (간난고한번상빈) 燎倒新停濁酒杯 (요도신정탁주배) · 登高 : 높은 동산에 오르다. 음력 9월 9일은 重陽節(중양절)인데 이날 登高(등고)하여 酒宴(주연)을 베풀고, 국화주를 마시고 茱萸(수유)를 머리에 꽂고 年中의 厄(액)을 拂拭(불식)하는 古俗(고속)이 있다. 이 시는 767년 가을 夔州(기주)에서 重陽節을 맞아 높은 樓臺(누대)에 올라가 가을철의 정경을 서술하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늙어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읊은 것이다. · 猿嘯哀 :
등악양루(登岳陽樓) [내부링크]
1. 등악양루(登岳陽樓)는? 두보가 유랑 생활을 하던 57세 때인 768년, 악양루에 올라 동정호수를 바라보며 그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2. 악양루(登岳陽樓) 원문 昔聞洞庭水 석문 동정수 今上岳陽樓 금상 악양루 吳楚東南坼 오월 동남탁 乾坤日夜浮 건곤 일야부 親朋無一字 친붕 무일자 老去有孤舟 노거 유고주 戎馬關山北 융마 관산북 憑軒涕泗流 빙헌 체사류 · 岳陽樓(악양루) : 岳陽樓는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定湖)의 동안(東岸)에 있는 누각이며, 동정호의 경치를 한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동정호(洞定湖)는 남북 100km, 동서 30~100km나 되는 중국 최대의 호수이다. · 昔聞洞庭水(석문동정수) : 일찍부터 동정호의 웅대하고 장엄함을 소문으로 들어왔다. · 今上岳陽樓(금상악양루) : 구경할 기회가 없다가 이제서야 악양루에 올라 동정호의 장관을 보게 되었다. · 吳楚東南坼(오초동남탁) : 동정호로 인하여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으로 갈라졌다는 뜻이다. · 乾坤日夜浮(건곤일야
절구(絶句) [내부링크]
1. 절구(絶句)은? 안록산(安祿山)의 난(755년~)을 피해 두보가 53세 때인 764년의 봄, 성도(成都)에 머물 때 지은 시로,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향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읊은 작품이다. 두보가 피난지 성도(成都)에서 지은 무제(無題)의 절구(絶句) 2수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다. 2. 절구(絶句) 원문 江碧鳥逾白 (강벽조유백)이요, 山靑花欲然 (산청화욕연)이라. 今春看又過 (금춘간우과)하니, 何日是歸年 (하일시귀년)고. 3. 절구(絶句) 언해(번역) 4. 현대어 풀이 강물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타는 것 같구나. 올 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바로 돌아갈 해인가? 5. 해설 · 강물이 파라니 새 더욱 희오 : 강과 새의 색채 대비 작자가 강가에 서서 파란 강물 위를 하얀 갈매기가 날아가는 광경을 보고 있다. · 산이 푸르니 꽃 빛이 불붙는 듯하도다 : 산과 꽃의 색채 대비 강가에 선 작자는 신록으로 가득찬 초
내훈(內訓) [내부링크]
내훈(內訓)은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가 궁중의 비빈과 부녀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한 교양서이다. 내명부(內命婦)의 훈화서로서 편찬하여 1475년(성종 6)에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나고야 봉좌문고(蓬左文庫)[호사문고(蓬左文庫)]에 소장되어있는 1573년(선조6) 을해자 중간본의 내사본과 1611년(광해군2) 훈련도감자 간행의 3권 3책 중간본, 1656년(효종7) 목판 간행의 3권 3책 중간본, 1736년(영조13) 무신자 간행의 3권 3책 ‘어제내훈(御製內訓)’ 등이 있다. 소혜왕후가 중국의 <소학(小學)>, <명감(明鑑)>, <여교(女敎)>, <열녀(烈女)>의 네 책에서 부녀자들의 행실과 도리에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 모은 것이다. 부녀자의 기본적인 말과 행실, 부모에 대한 효도, 혼인의 예절, 남편을 대하는 법, 어머니로서의 자세 등 여성이 갖추어야 할 행실의 실제와 규범을 밝혀 놓았다. 구성은 3권, 7장으로
노걸대(老乞大) 언해 [내부링크]
노걸대(老乞大)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이다. 정확히 누가 언제 저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문본 『노걸대』는 고려말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후기에 설치된 통문관(通文館)과 그 후신인 사역원(司譯院), 이를 계승하여 조선 초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사역원에서 중국어 실용 회화의 초급 교습서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언해, 개정되며 중국어 회화 학습을 위한 대표적 필수 학습서로 인식되었다. 노걸대(老乞大) 언해는 1670년(현종 11년)에 노걸대에 한글로 중국어 독음을 달고 언해한 서적으로 2권 2책의 분량의 활자본이다. 구체적인 작자와 간행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문관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현종 때 정상국(鄭相國)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책은 이에 앞서 중종 대에 지어진 최세진(崔世珍)의 『번역노걸대(飜譯老乞大)』를 참고하여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체재나 내용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내부링크]
고려 말부터 사용되던 중국어 학습 교재로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가 있다. 박통사를 한글로 독음을 달고 이를 언해한 책이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이다. 즉, 박통사의 원문에 한글로 중국어의 독음을 달고 언해한 중국어학습서이다. 박통사언해는 목판본으로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이담명의 서문 및 내사기(內賜記)에 의하면 167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지에 ‘박통사언해’라고 되어 있으며, 상·중·하 3책으로 3권 3책이다. 내용은 사절단의 왕래나 상인의 교역에 필요한 중국어 회화책이다. 중국음(中國音) 표기에는 정음(正音), 속음(俗音) 병기의 일치를 이루었고, 중국어 원문에 대한 구절 나누기가 일치되어있다. 여관에 드는 법, 말의 먹이, 방값, 등세 교섭, 통성명법, 물건을 사고파는 법, 음식 명칭, 복식 등에 이르는 당시 생활상이나 습속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국어교재인 ‘박통사언해’는 100년 가까이 조선의 중국어 학습 교재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金剛般若波羅蜜多經諺解) [내부링크]
1464년(세조10)에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한 불경 언해서이다.‘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또는 ‘금강경육조해언해(金剛經六祖解諺解)’라고도 부른다. 세조 8년(1462) 9월 세조가 잠을 자던 중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과 아들 의경세자를 만났다. 다음날 중궁(中宮) 또한 그날 꿈에 세종과 불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도 신묘하여 세조는 금강경 번역을 결심하고 직접 본문과 육조혜능(六祖慧能)의 구결(口訣)에 한글로 토를 달고 번역하였다. 이를 이듬해(1463년)에 한계희, 효령대군 등이 교정하여 1464년(세조10)에 간경도감에서 한글로 간행하였다. 이후 연산군 때인 1494년(연산군1)과 선조 때인 1574년(선조8)에 각각 중간되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승 불교의 3대 근본 경전 중 하나로 우리나라 조계종의 기본 경전이기도 하다. ‘금강경(金剛經)’은 석가모니가 금위국에 있을 때 설법하였던 내용을 그의 제자인 아난존자에 의해서
반야바라밀다심경 언해(般若心經疏顯正記-諺解) [내부링크]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般若波羅密多心經諺解)는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때 한계희 등이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을 언해한 불경서이다. 반야심경언해(般若心經諺解), 심경언해(心經諺解)라고도 한다. 세조 10년(1464년) 4월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 언해본이다. 통상 반야심경언해라고 부르는 이 언해 불전은 세조 10년인 1464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언해본은 반야심경 전문과 당나라 법장(法藏)스님이 지은 반야심경약소(般若心經略疏), 송나라 중희(仲希)가 쓴 반야심경약소현정기(般若心經略疏顯正記)에 당시 한글로 구결을 달아 번역한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은 대승 불교 반야사상(般若思想)의 핵심을 26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불경이다. 완전한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으로 그것은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을 뜻한다. 불교의 모든 경전 중 가장 짧은 것에 속하며,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
능엄경 언해 [내부링크]
능엄경 언해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자로 번역하고, 송나라 휘종때 승려 계환(戒環)이 요약하고 해설한 서역 대승불교의 불경인 ‘능엄경’(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한계희, 김수온 등이 혜각존자 신미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정식 명칭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이며, 너무 길어서 이를 줄여 ‘능엄경언해’라 부른다. 1461년 10월에 교서관에서 활자본(을해자)으로 간행하였으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1462년에 다시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목판본 ‘능엄경언해’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최초의 불경 언해서로,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귀중한 국어사 연구 자료이다. 또한 이후 간행된 간경도감 불경 언해서들이 이 책의 형태 및 번역 양식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 언해서들의 규범이 된 자료이기도 하다. ‘능엄경’은 당나라 때 중국 불교에서 마음 心
악장(樂章) [내부링크]
1. 악장(樂章)은? 조선시대 전기에 발생한 시가(詩歌) 형태이며, 궁중에서 종묘제향(宗廟祭享)때 부르던 송축가(訟祝歌)이다. 조선 건국 및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로, '악부(樂府)'라고도 한다. 조선 건국이 천명(天命)이었음을 들어 창업주(創業主)들의 공덕을 찬양하고, 임금의 만수무강(萬壽無疆)과 자손의 번창을 축원하며, 후대 임금을 권계(勸戒)하는 내용이다. 2. 형성 과정 (1) 조선 초기에 발생하여 세종 때 성행하다가 성종(成宗) 이후 소멸했다. (2) 경기체가(景幾體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싹튼 귀족 계층의 문학이다. (3) 초기에는 중국 고시체(古時體)의 형태를 본받았고, 훈민정음 제정 이후 약간의 국어가 섞인 현토체(縣吐體)로 바뀌었다가 후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같은 정형성(定型成)을 띤 신체(新體) 형식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4) 4구(句) 2절(節)의 형식이 기본을 이루나 변조형(變調形)도 많다. 3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내부링크]
1.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穆祖)에서 태종(太宗)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임금이 된다는 것은 긴 세월에 걸쳐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덕을 쌓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후대 임금은 이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공덕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경계하려는 내용이다. 2.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원문 3. 현대어 풀이 제1장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니 옛 성인들과 같으니 제2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제3장 주나라 대왕이 빈곡에 살으사 제왕의 업적을 여시니 우리 시조께서 경흥에 살으사 임금의 업적을 여시니 제4장 오랑캐들 사이에 가셔서 오랑캐들이 가래거늘 기산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니 야만인들 사이에 가셔서 야만인들이 가래거늘 덕원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니 제5장 칠수 · 저수 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내부링크]
1.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지은 노래이다. 1446년(세종 28)에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이듬해인 1447년(세종 29)에 수양대군(首陽大君, 훗날의 세조)이 산문 형태의 ‘석보상절’을 편찬하였다. 세종은 ‘석보상절’의 내용을 토대로 찬불가 형식의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 ‘월인천강(月印千江)’은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물을 비춘다는 말로 부처의 자비가 달빛처럼 모든 중생에게 비춘다는 의미이다. 2. 작자 : 세종대왕 3. 창작 및 간행 연대 : 세종 29년 (1447)으로 추정되며, 석보상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창작되었고, 간행은 세종31년(1449)에 이루어졌다. 4. 제작동기 :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 바친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세종께서 보시고 이 글을 지었다. 5. 형식 : 악장, 서사시 6. 의의 : 용비어천가와 함께 대표적인 신체 악장, 최대의 서
석보상절(釋譜詳節) [내부링크]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447년(세종 29)에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세종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首陽大君, 훗날 세조)에게 명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 불교의 전래 과정 등을 담아 한글로 책을 펴내도록 하였다. 수양대군은 ‘법화경(法華經)’, ‘아미타경(阿彌陀經)’, ‘석가보(釋迦譜)’, ‘석가씨보(釋迦氏譜)’을 비롯한 각종 불전에서 관련 내용을 뽑아 한글로 된 언해서를 완성하였다. 총 24권 중 10권만 남아 있다. 불교 서적 중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된 최초의 책이다. ‘석보’(釋譜)는 석가모니의 전기(傳記)를 의미하고, ‘상절'(’詳節)은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詳)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節) 쓴다는 뜻이다. 금속 활자에 의한 15세기 한글 산문 자료로서 한국 어학, 한국 문학, 한국 서지학, 한국 불교학에서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세종은 ‘석보상절’의 내용을 한글로 노랫말
월인석보 [내부링크]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하여 간행한 목판본 불교 서적이다. 1446년(세종28)에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돌아가신 소헌왕후(세종의 비, 수양대군의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1447년(세종29)에 세종의 명으로 아들인 수양대군이 불교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였고, 세종이 이 석보상절을 읽고 한글로 직접 노랫말(찬불가)를 지었는데 이를 엮어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편찬하였다. 이를 수양대군이 임금(세조)이 된 후인 1459년(세조5)에 이 두 책을 합하면서 증보·수정한 책이 '월인석보(月印釋譜)'이다. 월인천강지곡의 '월인(月印)'과 석보상절의 '석보(釋譜)'를 따 지은 이름이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주석의 형식으로 하여 편찬하였으며, 全 25권이고,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권1의 맨 앞 '훈민정음' 가운데 세종의
신도가(新都歌) [내부링크]
1. 신도가(新都歌)는?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이 한양의 아름다움과 태조 이성계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은 송도가(頌禱歌)이다. 2. 신도가(新都歌) 원문 3. 현대어 풀이 옛날에는 양주의 고을이여 그 경계에 새 도읍의 지세와 풍경이 빼어나도다 개국성왕께서 성대를 이룩하셨도다. 도성답도다! 지금의 경치가 참으로 도성답도다! 성수만년 하시니 만백성 모두 기쁨이로다 아으 다롱다리 앞은 한강수요, 뒤는 삼각산이라 덕이 많으신 이 강산 사이에서 만세를 누리소서 4. 내용 풀이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좋은 경치로구나. (1-2행 새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 / 조선 초기의 시가에 흔히 보이는 '~이샷다. ~이여, ~쇼서' 등의 감탄형 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대를 이룩하셨도다. (태조의 성덕)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새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 이 노래와 관련하여 창작 동기를 알 수 있는 구절) 임금께서 만 년을
유림가(儒林歌) [내부링크]
1. 유림가(儒林歌)는? 조선 초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악장(樂章)이다. 조선 창업의 위업을 송축하고 유생(儒生)들의 즐거움과 희망을 읊은 것으로,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2. 유림가(儒林歌) 원문 3. 작품 개관 · 작자 : 알 수 없음 · 연대 : 조선 초기(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음) · 장르 : 악장(속요체) · 구성 : 전 6장, 각 장 4행 · 주제 : 성군 출현에 대한 송축頌祝) · 제재 : 조선 건국 · 출전 :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감군은(感君恩) [내부링크]
1. 감군은(感君恩)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작자가 분명치 않은 악장(樂章)이다. 속요체 악장으로 군왕의 성덕이 끝이 없음을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2. 감군은(感君恩) 원문 3. 현대어 풀이 사해 바다의 깊이는 닻줄로 잴 수 있겠지만 임금님의 은덕은 어떤 줄로 잴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무강 하십시오.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무강 하십시오. 밝은 달빛 아래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하늘의 해에 미치지 못하듯이 임금님의 높으신 은덕은 그 하늘과 같이 높으십니다.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무강 하십시오.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무강 하십시오. 밝은 달빛 아래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아무리 넓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배를 타면 건널 수 있겠지만 임금님의 넓으신 은택은 한평생을 다한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무강 하십시오. 끝없는 복을 누리시며 만수
문덕곡(文德曲) [내부링크]
1. 문덕곡(文德曲)은? 1393년(태조 2)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도가(頌禱歌) 조선 태조 2년(1393)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노래. 조선의 창업을 송축한 노래로서,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미한 내용임.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전함. 4장. 2. 문덕곡(文德曲) 원문 1) 개언로(開言路) 法宮이 有儼深九重 하시니 一日萬機紛其叢 하샷다 君王이 要得民情通 하샤 大開言路達四聰하시다 開言路臣所見가 我后之德이 與舜同하샷다 아으 我后之德(아후지덕)이 與舜同(여순동)하샷다 2) 보공신(保功臣) 聖人受命乘飛龍하시니 多士競起如雲從하샷다 協謀效力이 成厥功하시니 誓以山河로 保始終하샷다 保功臣臣所見가 我后之德이 垂無窮하샷다 아으 我后之德(아후지덕)이 厜無窮(수무궁)하샷다 3) 정경계(正經界) 經界毀矣라 久不修하야 強幷弱削相炰烋거늘 我后正之하샤 期甫周하니 倉廩이 充富코 民息休하도다 正經界臣所見가 烝哉樂豈享千秋하샷다 아으烝哉樂愷享千秋(증재악개향천추)하샷다 4) 정례악(定禮樂) 爲政之要在禮樂하니
정동방곡(靖東方曲) [내부링크]
정동방곡(靖東方曲)은 조선시대 때인 1393년(태조 2)에 개국공신인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한문 악장으로 송도가(頌禱歌)이다. 내용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칭송한 것이다.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납씨가(納氏歌) [내부링크]
1. 납씨가(納氏歌)는? 조선시대 태조 2년(1393년)에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축가(頌祝歌)이다(악장). 1362년(공민왕 11)에 이성계(李成桂)가 동북면(東北面)에 침입한 원나라 장군인 나하추[納哈出]를 물리친 무공을 찬양한 내용이다.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가사, 악학궤범 등에 실려 전한다. 2. 납씨가(納氏歌) 원문
봉황음(鳳凰吟) [내부링크]
1. 봉황음(鳳凰吟)은? 조선 세종 때 윤회(尹淮)가 지은 별곡체 악장이다. 조선의 문물제도를 찬미하고 왕가(王家)의 태평을 기원한 송축가이다. 가사는 악학궤범에, 악보는 세종실록과 대악후보에 전한다. 2. 봉황음(鳳凰吟) 원문 3. 현대어 풀이 (전강) 천리강토 이나라에 아름다운 기운이 울창하시도다 금으로 꾸민 훌륭한 궁전 구중 문안에 일월같이 밝은 덕을 밝히시니 뭇 신하 천년에 구름 탄 용 같은 영걸을 모으시도다 화평한 백성의 풍속은 춘대위에 있거늘 많고 많은 뭇 백성은 잘 다스려진 강역 안에 있도다. (부엽) 많고 많은 뭇 백성은 잘 다스려진 강역 안에 있도다 (중엽) 높고 두터우며 사사로움이 없으며 요순같은 은택 송축하는 이 다들 태평성대 사람이도다 (부엽) 요순같은 은택 송축하는 이 다들 태평성대 사람이도다 (소엽) 치열하고 창성하시니 예악의 광화가 한당보다 더하시도다 임금의 자손이 빼어나게 나서 천년토록 거룩하시니 면면한 외덩굴 더욱더 융성하여 만세의 터전 되시도다 국가의
훈민정음·훈민정음 해례본 [내부링크]
1.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의미 ‘훈민정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글자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책 이름이다. 144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나라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말한다. 제작 당시에는 자음 17자[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ㆆ, ㅎ ㅇ, ㄹ, ㅿ], 모음 11자[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합 28자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훈민정음’ 대신 ‘한글’이라 부르고, 자음 14자, 모음 10자이다. 또 다른 하나는 1446년 글자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글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해 놓은 책을 말한다. 글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한다. 훈민정음의 판본에는 해례본(한문본), 언해본이 있다. 완전한 책의 형태를 지닌 것은 해례본이다. 2.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가.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세종이 1443년(세종25) 음력 1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내부링크]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은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해례본’ 중에서 앞부분인 세종이 직접 쓴 ‘어제(御製)서문’과 훈민정음 28자를 설명하는 ‘예의(例義)’ 부분만 한글로 풀이하여 세조때인 1459년(세조5)에 간행하였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 ‘정인지 서(鄭麟趾序)’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 ‘예의(例義)’는 세종이 지은 서문, 즉 ‘세종어제(世宗御製)’와 ‘훈민정음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담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해례본의 ‘예의(例義)’ 부분만 한글로 풀어쓴 것이 ‘훈민정음언해본’이다. 따라서 해례본의 ‘해례解例)’와 ‘정인지 서(鄭麟趾序)’는 훈민정음언해본에는 없다. 별도의 책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1459년(세조5)에 간행된 목판본 ‘월인석보(月印釋譜)’ 권1의 맨 앞에 실려 있다. ‘월인석보본(月印釋譜本)’ , ‘주해본(註解本)’이라고도 한다. ‘월인석보(月印釋譜)’는 각각 1447년(세종29)에 간행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
미타찬(彌陀讚) [내부링크]
1. 미타찬(彌陀讚)은? 미타찬(彌陀讚)은 조선 초기에 승려 기화(己和)가 지은 경기체가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경기체가중의 하나로 함허당어록(涵虛堂語錄)에 수록되어 있다. 미래불(未來佛)인 아미타불을 찬양함으로써 서방정토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지었다. 2. 미타찬(彌陀讚) 원문 第一 從眞起化 제일 종진기화 普明空 眞淨界 本無身土 보명공 진정계 본무신토 爲衆生 興悲願 方有隱現 위중생 흥비원 방유은현 我等衆生 長在迷途 無所依歸 아등중생 장재미도 무소의귀 嚴土現形 最希有 엄토현형 최희유 是則名爲 幻住莊嚴 再唱 시칙명위 환주장엄 재창 方便接引 방편접인 第二 隨機現相 제이 수기현상 自受用 他受用 自他受用 자수용 타수용 자타수용 大化身 小化身 三種化身 대화신 소화신 삼종화신 如是身雲 熏現自在 究竟圓滿 여시신운 훈현자재 구경원만 普應無方 亦希有 보응무방 역희유 是則名爲 大慈悲父 再唱 시칙명위 대자비부 재창 随類攝化 수류섭화 第三 覩相生身 제삼 도상생신 大悲王 大慈父 阿彌陀佛 대비왕 대자
안양찬(安養讚) [내부링크]
1. 안양찬(安養讚)은? 조선 전기에 기화(己和)가 지은 경기체가로 불교인이 염원하는 안양(安養 : 극락)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함허당어록(涵虛堂語錄)’에 전한다. 2. 안양찬(安養讚) 원문 第一 彼此同化 大導師 阿彌陀 現彼接引 我本師 釋迦文 勸令往生 彼此如來 同以大悲 各設方便 共度迷淪 最希有 彼佛此佛 大悲大化 再唱 恩踰父母 제1 피차동화 대도사 아미타 현피접인 아본사 석가문 권령왕생 피차여래 동이대비 각설방편 공도미륜 최희유 피불차불 대비대화 재창 은유부모 第二 依正俱勝 曰極樂 曰安養 名彼佛土 無量光 無量壽 名彼如來 但聞其名 其中活計 一念便知 欣彼往生 亦希有 佛於彼國 現住說法 再唱 海會照然 제2 의정구승 왈극락 왈안양 명피불토 무량광 무량수 명피여래 단문기명 기중활계 일념편지 흔피왕생 역희유 불어피국 현주설법 재창 해회조연 第三 純樂無憂 彼佛國 無三惡 亦 無舞八苦 往生人 身金色 皆具妙相 宮殿隨身 衣食自然 一切具足 常享無極 亦希有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 隨念現前 제3 순락무우 피불
미타경찬(彌陀經讚) [내부링크]
1. 미타경찬(彌陀經讚)은? 조선 초기에 승려 기화가 지은 미타불의 법신(法身)을 예찬한 노래이다. 2. 미타경찬(彌陀經讚) 원문 第一 開示捷徑 大矣哉 大導師 釋迦文佛 應群機 開三乘 無法不說 更於其間 別開方便 演說是經 今修淨土 最希有 大悲世尊 說示此經 再唱 如暗得證 第二 指途迷倫 可憐生 可憐愍 我等衆生 生復死 死復生 苦無盡期 惟我世尊 善權便便 開示勸進 令不退墮 亦希有 惟我本師 導生大悲 再唱 如保赤子 第三 讚土令欣 彼佛國 名極樂 安養淨土 我本師 示人天 所以爲樂 其中莊嚴 種種殊勝 滿口稱揚 勸令往生 亦希有 我大導師 無上法王 再唱 讚彼淨土 第四 讚佛勸念 彼佛號 無量光 亦無量壽 我本師 示人天 所以無量 不可思議 功德之利 滿口稱揚 勸令勸念 亦希有 我大導師 衆聖中尊 再唱 讚彼彌陀 第五 六方同讚 東南方 西北方 上下諸佛 廣長舌 遍大千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身諸佛 所護念經 如是同讚 亦希有 佛佛皆以 廣長舌相 再唱 同讚勸持 第六 此彼相接 如本師 釋迦尊 讚佛功德 彼諸佛 亦稱讚 我佛如來 能於五濁 成大菩提 說難信
기우목동가(騎牛牧童歌) [내부링크]
1. 기우목동가(騎牛牧童歌)는? 조선 초기에 승려 지은(智訔)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2. 기우목동가(騎牛牧童歌) 원문 1장 生生世世 頓脫邪見 遠離邪魔 世世生生 絶貪嗔癡 除滅我慢 爲 回向三處 景幾何如爲尼伊古 回向三處 實相圓滿 再云 爲 度諸迷淪 景 我好下ᄉᆞ 阿彌陀佛 云云 생생세세 돈탈사견 원리사마 세세생생 절탐진치 제멸아만 위 회향삼처 경기하여위니이고 회향삼처 실상원만 재운 위 도제미륜 경 아호하ᄉᆞ 아미타불 운운 2장 如呑今後 後不復造 恒住淨戒 業幾淸淨 具發菩提 究竟成道 爲 報佛大恩 景幾何多爲尼伊古 報佛大恩 大丈夫亦 再云 爲 發明輪回 景 我好下ᄉᆞ 阿彌陀佛 云云 여탄금후 후불부조 항주정계 업기청정 구발보제 구경성도 위 보불대은 경기하다위니이고 보불대은 대장부역 재운 위 발명윤회 경 아호하ᄉᆞ 아미타불 운운 3장 歷覽宗師 決疑眞宗 更加精進 鶉衣一瓢 世世生生 不退淨行 爲 出於根塵 景幾何多爲尼伊古 出於根塵 萬物無心 再云 爲 四洲遊方 景 我好下ᄉᆞ 阿彌陀佛 再云 역람종사 결의진종 갱가정진
불우헌곡(不憂軒曲) [내부링크]
1. 불우헌곡(不憂軒曲)이란? 정극인은 벼슬을 그만두고 태인(전북 정읍)에서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향리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이에 성종은 삼품(三品)의 작위를 하사하고, 그 지방 관찰사로 하여금 혜택을 베풀도록 하였다. 이에 감격하여 이 노래를 지어 성군(聖君)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고 한다. 2. 불우헌곡 원문 제1장 山四回 水重抱一畝儒宮 向陽明 開南牕 名不憂軒 左琴書 右博奕 隨意逍遙 偉 樂以忘憂 景 何叱多(景긔엇더삿다) 平生立志 師友聖賢 再唱 偉 遵道而行 景 何叱多(景긔엇더삿다) 산사회 수중포 일무유궁 향양명 개남창 명불우헌 좌금서 우박혁 수의소요 위 낙이망우 경 하질다 평생립지 사우성현 (재창) 위 준도이행 경 하질다 제2장 晩生員 老及第 樂天知命 再訓導 三敎授 誨人不倦 家塾三間 鳩聚童蒙 詳說句讀 偉 諄諄善誘 景 何叱多(景긔엇더삿다) 不亦樂乎 負笈書生 再唱 偉 自遠方來 景 何叱多(景긔엇더삿다) 만생원 노급제 낙천지명 재훈도 삼교수 회인불권 가숙삼간 구취동몽 상설구독 위
금성별곡(錦城別曲) [내부링크]
1. 금성별곡(錦城別曲)은? 조선 성종 때인 1480년(성종11)에 박성건(朴成乾)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작자인 박성건이 금성(錦城)[현재의 전남 나주)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가르친 제자 열 명이 소과에 급제하자 그 감격을 자랑한 내용이다. 2. 금성별곡(錦城別曲) 원문 제1장 海之東 湖之南 羅州大牧 해지동 호지남 나주대목 錦城山 錦城浦 亘古流峙 금성산 금성포 긍고류치 爲 鍾秀人才 景幾何如 위 종수인재 경기하여 千年勝地 民安物阜 (再唱) 처년승지 민안물부 (재창) 爲 佳氣 籠 景幾何如 위 가기총롱 경기하여 제2장 大成殿 明倫堂 前廟後寢 대성전 명륜당 전묘후침 東西齋廊 左右夾室 泮水洋洋 동서재랑 좌우협실 반수양양 手植檜 碧松亭 高隱鄕校 수식회 벽송정 고은향교 七十門人 三千弟子 濟濟 칠십문인 삼천제자 제제창창 爲 切磋琢磨 景幾何如 위 절차탁마 경기하여 有時漁經 有時獵史 (再唱) 유시어경 유시렵사 (재창) 爲 日就月將 景幾何如 위 일취월장 경기하여 제3장 金牧伯 吳通判 一時人傑 김목백 오통
배천곡(配天曲) [내부링크]
1. 배천곡(配天曲)은? 조선 성종 때인 1492년(성종23) 8월에 공자의 제사를 위하여 지은 경기하여체 가락이다. 성종실록에 실려있다. 2. 배천곡(配天曲) 원문 1장 維我后 履大東 克配彼天 斂五福 錫庶民 建其有極 勅我五典 式敍彛倫 化行俗美 至治蝟興 景幾何如 壽域春臺 一世民物 再唱 熙熙皥皥 景幾何如 2장 天縱聖 日就學 緝熙光明 尊先師 重斯道 稽古彌文 釋尊素王 以洽百禮 旣多受祉 崇敎隆化 景幾何如 橋門觀聽 盖億萬計 再唱 臨雍盛擧 景幾何如 3장 思樂 泮宮采芹 我后戾至 住翠華 御帳殿 冉冉需雲 簪纓百僚 衿佩諸生 濟濟蹌蹌 同宴以飮 景幾何如 以酒以德 旣醉旣飽 再唱 載賡周雅 景幾何如 3. 풀이 1장 우리 임금(成宗) 조선을 다스리매, 능히 저 하늘과 짝하였도다. 오복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내려줌에, 임금은 極(정사의 목표)을 세우느니, 우리 五典을 신칙하게 하고, 이 법칙을 항상 지켜야 할 인륜으로 펴서, 교화가 행하여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도다. 지극하게 잘 다스려져 성하게 일어나는 광경, 그것
화전별곡(花田別曲) [내부링크]
1. 화전별곡(花田別曲)은? 조선 중종 때 문신 김구(金絿)가 지은 경기체가이다. 경상남도 남해의 화전으로 귀양 가서 그곳의 뛰어난 경치를 읊은 것으로, ‘자암집(自菴集)’에 실려있다. 2. 화전별곡(花田別曲) 원문 3. 내용 구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총괄적인 서사, 제 2~5장은 구체적인 자랑거리를 노래한 본사, 제6장은 자신의 감회를 노래한 결사에 해당한다. 1장 : 산천이 수려하고 많은 인물을 배출한 남해섬의 뛰어남을 찬탄하고, 그 속에서 그곳 인물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자신을 과시 2장 : 그곳 향촌의 벼슬아치와의 잡담, 음식, 코골기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는 광경등을 찬양하고, 이어 풍월을 잘하는 인물과 노래로 화답하는 모습을 과시 3장 : 여러 기생들의 가무 및 장구 소리와 그들의 뛰어난 미모를 바라보는 광경을 자랑하고, 남해섬의 별명인 화전과 미모의 기녀가 많은 고장의 실제 모습이 서로 잘 어우려져 사람들의 간장을 녹이게 한다고 찬탄 4장 :
태평곡(太平曲) [내부링크]
태평곡(太平曲)은 조선 중종(재위 1506∼1544)때에 주세붕(周世鵬)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역대 성군의 은덕을 찬양한 것으로,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죽계지’에 실려 있다. 1541년(중종 36)에서 1544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1544년 작자가 편찬한 『죽계지(竹溪誌)』에 수록되었고, 그의 문집인 『무릉잡고(武陵雜稿)』(別集 권8)에도 실려 있다. 내용은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던 옛 중국의 성군현신(聖君賢臣)들의 치국과 치민을 찬양하는 것이다.<출처: 태평곡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동곡(道東曲) [내부링크]
1. 도동곡(道東曲)은? 조선 중종 때에 주세붕이 지은 경기체가. 도학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친 것을 찬양한 노래로, 모두 9장으로 되어 있다. 주세붕의 ‘무릉집(武陵集)’에 전한다. 2. 도동곡 원문 3. 내용 작가가 안향의 옛집터인 순흥의 죽계에 문성공사(안향을 모신 사당)를 세우고, 영정을 봉안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 뒤 작가가 이 작품 등을 '죽계지'에 수록하려 하였을 때, 황준량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작가는 그의 시가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옛 성현의 격언을 옮긴 것이므로, 수양과 풍속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뺄 수 없다고 하였다. 본래 경기체가는 그 형태의 단형성으로 인하여 내용의 서술이 크게 제약되어 사건의 서술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작품은 그 연장구조를 통하여 사상르 시간적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서사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형태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경기체가 본래의 정형인 전대절과 후
육현가(六賢歌) [내부링크]
1. 육현가 (六賢歌)는? 조선 중종 때에 주세붕이 1541년(중종 36)부터 1544년까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경기체가이다. 중국 송나라의 정자(程子) 형제, 소강절(邵康節), 사마광(司馬光), 한기, 범중엄(范仲淹) 등 여섯 현인(賢人)의 덕행을 칭송한 것으로 '무릉잡고(武陵雜稿)'와 '죽계지(竹溪誌)"에 실려 있다. '무릉잡고(武陵雜稿)'와 '죽계지(竹溪誌)"지는 주세붕의 작품이다. 2. 육현가 (六賢歌) 원문 3. 풀이 1장 規는 圓이오․矩는 方이다. 繩은 수직이오․ 準은 수평을 이른다. 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로, 아! 程伊川(頤)선생께서 참으로 이렇게 대사를 성취하시매, 그 귀한 줄을 누가 알 것입니까? 2장 일찍 孫子(武)와 吳子(起)와 같은 병법을 즐겼고, 늦게서야 석가의 불교와 노자의 도교에서 도망친, 張橫渠(載)선생께서 일변하여 지극한 도학을 힘써 밟아가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3장 손으로는 極西쪽을 더듬듯, 발로는 하늘의 동쪽을 밟
엄연곡(儼然曲) [내부링크]
1. 엄연곡(儼然曲)은? 조선 중종 때에 주세붕이 1541년(중종 36)부터 1544년까지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경기체가이다. 군자의 엄연한 덕과 성리학의 진리를 읊은 작품으로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으며 '무릉잡고(武陵雜稿)'와 '죽계지(竹溪誌)"에 실려 있다. 2. 엄연곡(儼然曲) 원문 3. 내용 구성 내용은 도의 현상에 대한 찬탄, 성현에 대한 숭모, 그리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계감과 도의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되어 있다. 그의 다른 경기체가와 마찬가지로 후절로만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 '4·4·4·4 偉~景幾何如'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3장과 5장은 '4·4·4·4 偉~景幾何如'가 그 배수인 '4·44·44·44·4 偉~景幾何如'로 되어 있고, 4장은 4·4·4·4 /…'또는 그 배수적 발달의 형태가 아닌 3보격의 독특한 장형화 양상을 보여준다. 경기체가 형식의 변모와 붕괴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세붕이 안향의 고향에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독락팔곡(獨樂八曲) [내부링크]
1. 독락팔곡(獨樂八曲)은? 조선 명종, 선조 때의 학자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경기체가로서 최후의 작품이며, 빈부귀천을 하늘에 맡기고 일생을 한가롭게 살아가는 멋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으로 작자의 문집인 송암집(松巖集)에 실려 있다. 2. 독락팔곡(獨樂八曲) 원문
화산별곡(華山別曲) [내부링크]
1. 화산별곡(華山別曲)은? 화산별곡 (華山別曲)은 조선 세종7년인 1425년에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2. 화산별곡(華山別曲) 원문 (1장) 華山南 漢水北 朝鮮勝地 白玉京 黃金闕 平夷通達 鳳峙龍翔 天作形勢 經經陰陽 偉 都邑 景其何如 太祖太宗 創業貽謀 (再唱) 偉 持守 景其何如 화산남 한수북 조선승지 백옥경 황금궐 평이통달 봉치용상 천작형세 경위음양 위 도읍 경기하여 태조태종 창업이모 (재창) 위 지수 경기하여 (2장) 內受禪 上稟命 光明正大 禁草竊 通商賈 懷服倭邦 善繼善述 天地交泰 四境寧一 偉 太平 景其何如 至誠忠孝 陸隣以道 (再唱) 偉 兩得 景其河如 내수선 상품명 광명정대 금초절 통상고 회복왜방 선계선술 천지교태 사경녕일 위 태평 경기하여 지성충효 육린이도 (재창) 위 양득 경기하여 (3장) 存敬畏 戒逸欲 躬行仁義 開經筵 覽經史 學貫天人 置集賢殿 四時講學 春秋製述 偉 右文 景其何如 天縱之聖 學問之美 (再唱) 偉 古今 景其何如 존경외 계일욕 궁행인의 개경연 남경사 학
가성덕(假聖德) [내부링크]
1. 가성덕(假聖德)은? 가성덕(假聖德)은 세종 때인 1429년에 예조에서 지은 경기체가이다. 조선 창업과 명나라의 공덕을 읊은 노래로 송도가(頌禱歌)인 악장문학에 속하며, 중국 사신을 위한 향연에서 불리어졌다. 2. 가성덕 원문 第1章 於皇明 受天命 聖繼神承 (어황명 수천명 성계신승) 履九五 大一統 撫綏萬邦 (이구오 대일통 무수만방) 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來庭 (일월소조 상로소추 막불래정) 偉 四海一家 景 何如 (위 사해일가 경 하여) 帝德廣運 覃被九圍 再唱 (제덕광운 담피구위 재창) 偉 四海一家 景 何如 (위 사해일가 경 하여) 第2章 九天上 皇華使 聿至海東 (구천상 황화사 율지해동) 宣上德 達下情 洞達無間 (선상덕 달하정 통달무간) 玉節星軺 峩冠麗服 望若天仙 (옥절성초 아관려복 망약천선) 偉 愛之敬之 景 何如 (위 애지경지 경 하여) 第3章 降綸綍 布德音 天貺便蕃 (강륜발 포덕음 천황편번) 吐雲霞 輝星日 偏荷恩憐 (토운하 휘성일 편하은련) 神人胥悅 父老騰歡 蹈舞蹁躚 (신인서열
오륜가(五倫歌) [내부링크]
1. 오륜가(五倫歌)는? 조선 전기의 경기체가로 五倫을 내용으로 하여 지은 것이다. 6연으로 되어있으며, 작자는 알 수 없다. 세종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전하며, 악학편고 樂學便考에도 실려 있다. 2. 오륜가(五倫歌) 원문 3. 내 용 1장 : 서장 2장 : 오륜을 지켜나가는 떳떳한 도리가 만고를 통하여 이어져 흐르는 모습 3장 : 부모를 봉양하고 문안드리는 광경 4장 : 임금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태평성대가 이룩된 모습 5장 : 부부가 화합하는 모습 6장 : 형제가 의리로써 사양하는 광경을 각각 자랑스럽고 훌륭한 모범으로 과시 4. 작품 개관 · 갈래 : 경기체가 · 연대 : 조선 초기 세종 · 작자 : 미상 · 주제 : 유학(儒學)의 오륜(五倫)을 5장(章)에 나누어 읊음 · 형식 : 전형적인 율격 양식 준수 · 의의 : 오륜(五倫)은 오교(五敎)라고도 한다. 인생에 있어 대인관계를 5가지로 정리하여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오상(
연형제곡(宴兄弟曲) [내부링크]
1. 연형제곡(宴兄弟曲)은? 연형제곡(宴兄弟曲)은 조선 전기에 지어진 작자와 연대 미상의 경기체가이다. 형제 사이의 우애와 조선의 문물을 칭송한 작품으로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모두 5연으로 되어 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2. 배경 동생으로서 왕위에 오른 세종이 양녕, 효녕대군을 형님으로 받들면서 그 우애를 돈독히 하고, 그 형들은 신하로서 동생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실의 지극한 우애를 창작 배경으로 깔고 있으며, 그러한 형제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태평을 구가하게 된다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경기체가 특유의 형식에 담아 당당하게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선대인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제를 죽여야 하는 혹독한 윤리적 시련이 있었음에 반해, 세종의 형제들은 그 우애와 직분을 다함에서 건국 초기의 국가의 기반이 확고해졌음을 감격해하고 과시하는 어조로 담은 작품의 창작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3. 내용 구성 세종 1
서방가(西方歌) [내부링크]
1. 서방가(西方歌)는? 조선 세종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경기체가로 불교세계를 읊고 있는데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어진 작품이라 볼 수 있다. 2. 서방가(西方歌) 원문 3. 내용 구성 내용은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이 극락세계의 실존을 읊고, 제2장이 극락세계 주위환경의 장엄함과 극락인이 중생의 고통없이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제3장이 극락내부의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한 경치와 서방정토의 아홉 종류의 생물들도 쾌락을 향유하는 모습을, 제4장이 공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제5장이 극락조들도 화기롭고 우아한 소리로 설법하여 연년삼매에 이른 경지를, 제6장이 미풍에도 천악성이 울려 염물 염법의 마음이 생기며, 보배로운 나무와 밝은 달도 능히 설법하고 법을 들어 권선하는 모습을, 제7장이 극락인의 영생하는 모습을, 제8장이 보살과 성문(聲聞)들이 상선인과 벗하며 선심을 증진하는 모습을, 제9장이 아미타불의 빼어난 공덕을, 제10장이 중생을 교화하는 아미
왕가도, 왕건, 왕규, 왕산악, 왕인, 우륵 [내부링크]
왕가도(王可道) 고려 초기의 문신. 본래의 성은 이(李). 초명은 자림(子琳). 시호는 영숙(英肅). 성종 때 ...
도조법(賭租法) 타조법(打租法) [내부링크]
블로그우리역사 소작료 징수 방법에 따른 소작제도의 분류 : 도조법, 타조법 도조법(賭租法) 지주와 소작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커뮤니티
커뮤니티